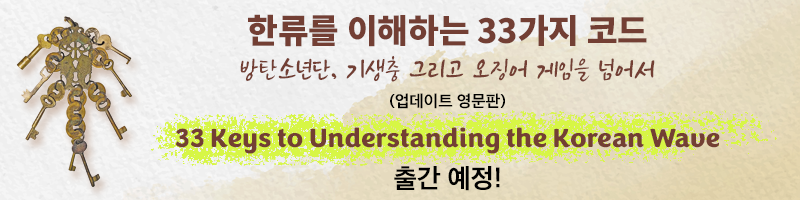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6)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44) 마종일: 이글거리는 불꽃과 차가운 보름달
대나무 숲 (5)
보름달 IV
내 속의 응어리를 녹여준 불 (火)
그 모든 것을 태워 버린 불로 인해 나의 마음 속에 얽혀있던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져 없어져버린 것 같았다. 나의 의식만이 남아 공중에 떠 있는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그 신령한 불은 마음 속 여기 저기에 끼어있는 나의 욕의 의지와 슬픔 기쁨의 바탕을 깨끗이 씻어내어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 나갔다.

You Have To Run, Don’t Look Back, bamboo, rope, wood, 20’x120’x30’, 2009,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Korea Photo: Young Tae Kim
준비한 마른 잔가지를 서로 가로 지르며 쌓고, 그 밑에 마른 나뭇잎을 살짝 괴어 넣었다.
라이터를 켜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잎사귀 밑에 넣었다. 순식간에 퍼져 나가는 불꽃. 잔가지가 타는 것을 본 후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밑에 타오르는 불쏘시개에 방해 가지 않도록 쌓아 올렸다. 비교적 마른 여름이 지속되었던 날들. 산 정상은 이미 가을 냄새가 나고 있었고 상당히 건조했다. 불은 거침없이 빠르고 힘차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겁이 많고 정해진 규칙에 철저하고 젠틀한 나의 친구, 브라이언은 그의 30여년 캠핑 히스토리에서 가장 거대하고 위대하기? 짝이 없는, 나의 새로운 이정표 적인 ‘봉화불’이 그 역사적 현장의 산봉우리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다. 불 피우는 것을 좋아하는 나 역시도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큰 불은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마주한 아주 넓게 만들어진 캠프파이어 장소를 맥시마이즈한 것일 뿐. 초기에 흥분해서 애써서 끌고 온 보통 어른의 허벅지보다 크고 족히 5미터 정도 되는 통나무를 보더니 그는 나에게 그 통나무들을 정말 태울 건지 물었다. 당연지사. 그가 잠시 한국에서 있을 때 겪은 코리언에 대한 갖가지 화려한 기억들을 충분히 되살리고 남을 일. 불은 이내 그의 그 기억들이 다 돌아 오기도 전 순식간에 3, 4미터 높이의 크기로 커져가고 있었다. 아직도 한참 불 옆에 가득 쌓여 있는 나무들.
95년 말 한국에서 돌아온 코리언에 대한 기억들이 차츰 사라질만한 시기에 다시 한번 코리언을 만난 나의 첫 뉴욕 친구, 나의 영어 선생님. 아마도 같이 온걸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 하지만 분명히 그 역시 엉덩이뼈 끝이 아리는 불안한 쾌감 그리고 동시에 그의 머리를 움켜쥐는 우려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 이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가 수년간 마치 쌓인 뭔가를 털어 내듯 반복해서 그 불에 황당함에 대해 되뇌이곤 했던 데서 익히 짐작이 가능했다. 경험을 통해 ‘쌓인 감정’은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분출한다는 것.
반경 수 미터가 되어 활활 타오르는 불을 나 또한 한국 어느 산 꼭대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피운 적은 없었었다. 아니 한국에선 불가능한 일. 나의 의지를 충분히 읽은 듯 열념같이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불. 분명 인간의 깊숙한 내면을 끌어 내는 미묘함이 있기 도 한 그 불은 주위를 환하게 비추며 나의 내면에 무겁게 쌓여 있던 것들을 천천히 산화해 갔고, 저 높이에 떠 있던 차가운 둥근 보름달과 그 따뜻함과 차가움에 있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타고 있었다.
캠핑을 갈 때마다 열렬한 불을 태우는 것은 나의 전문 영역이기도 하다. 불은 확실히 특별한 그 무엇이다. 한 영화, 스님은 후반부의 긴 시간 동안 활활 타오르는 불, 큰스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다비불 앞에 앉아 있었다. 그 불은 환하게 밤 깊은 주위를 밝히고 있었다. 쌓아 놓은 장작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그 한밤중 내내 타오르는 불의 신력, 온갖 잡스러운 이승 삶에서 얽힌 상념들의 찌꺼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산화시키려듯 싸그리 태워버리는 그 경이로움. 기나긴 온 밤 동안 태우고, 불이 꺼진 회색빛 재를 뒤적이는 그의 손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몇 개의 작은 뼈 조각이 쥐어 질 즈음에는 동쪽 산 위로 천천히 빛이 들어 올라지는 새벽녘. 그에게 수시로 건너 오던 낭랑한 큰스님의 목소리, 깨달음에 대한 치달음은 없어지고, 땅과 공중 그리고 저 하늘 높이 사라져 버린 큰스님. 그가 천천히 일어날 때쯤까지 나도 완전히 숨죽이고 앉아 있었다.
그 모든 것을 태워 버린 불로 인해 나의 마음속의 얽혀있던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져 없어져버린 것 같았다. 나의 의식만이 남아 공중에 떠 있는듯한 착각에 휩싸였다. 그 신령한 불은 마음 속에 여기 저기 끼어있는 나의 욕의 의지와 슬픔 기쁨의 바탕을 깨끗이 씻어내어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 나갔다. 그도, 그것을 지켜보던 나도 삼천 대천 억겹의 연기에 쌓인 것들을 활활 태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재가 되어 우주의 이곳 저곳으로 흩뿌려져 내어 날으는 연기에 편승해 끝이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다.
브라이언과 나는 이제 상당히 안정되게 타고 있는 불 앞에 앉아 있었다. 이제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많은 복잡하고 불편한 생각들, 긴장감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었고, 마음이 차츰 느긋해 가고 있었다. 불은 이리저리 부는 방향을 달리하는 바람에 따라 꿈틀거리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때로는 세차게 또는 부드럽게 타오르고 있었다. 가끔씩 불꽃이 높이 차 오를 때마다 주위에 있는 나뭇잎들이 불빛을 반사하며 일렁이곤 했다. 차츰 그 앞에 앉아 있던 나는 점점 차분한 감정 속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점차 모닥불 하단부에 상당히 굵고 많은 양의 연홍색 숯불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들은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곤 했던 시골장터 대장장에서 본 붉게 변한 무쇠 덩어리 같은 붉은 색을 띈 것들이었다. 그 연홍색 불은 가끔씩 연기가 전혀 맺히지 않은 아주 부드러운 속 불꽃을 만들곤 할 뿐 같은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다.
 마종일/작가
마종일/작가
1961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나 덕수상고 졸업. 대우 중공업을 거쳐 한겨레 신문사 감사실에서 일하다 1991년 퇴사한 후 박재동 화백 소개로 그의 후배 화실에서 그림을 배웠다. 1996년 뉴욕으로 이주 스쿨오브비주얼아트를 졸업했다. 이후 2006 광주미술관 레지던시 작가, 2008 소크라테스 조각공원 신임미술가로 선정되었으며, 2009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2010 폴란드 로츠(Lodz) 비엔날레에 초청됐다. 2010 LMCC 거버너스아일랜드, 2011 랜달스아일랜드, 롱아일랜드 이슬립미술관, 브롱스 미술관 전시에 참가했다. 2008 알(AHL)재단 공모전에 당선됐으며, 2012 폴락크래스너 그랜트를 받았다. http://www.majong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