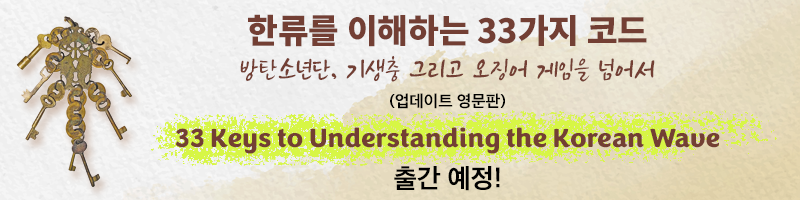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3) 김원숙: 아직도 가슴이 뛰는 도시, 뉴욕
이야기하는 붓 (1)
아직도 가슴이 뛰는 도시, 뉴욕
거의 40년 전, 처음 뉴욕을 보았을 때도 그랬다. 지금처럼 조용한 흥분이 일어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만, 그 흥분이 가라앉는 시간이 다르다. 지금은 인디애나와 뉴욕을 오가며 살고 있지만 뉴욕에서 사나흘이 지나면 조용한 시골집이 그리워지는 건 단순히 나이 탓일까.
1974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다닐 때 미술대학원 수학여행으로 뉴욕에 처음 왔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12시간이 넘는 버스여행 동안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던 남자 친구와 함께 조지 워싱톤 다리를 건너면서 펼쳐지는 뉴욕을 보며 막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도 뉴욕은 올 때마다 그때의 떨림을 다시 느끼게 한다.
버스 가득 옥수수밭에서 온 촌 동네 학생들과 카네기홀 뒤에 있는 어느 호텔에 짐을 내려놓자마자, 지도를 놓고 치밀하고 지루하게 행로를 계획하는 동료 학생들을 뒤로 두고, 혼자 이 도시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뉴욕이 주는 흥분은, 위험하다고 말리는 남자친구가 소심하고 졸렬하게 느껴지게 했다.
이상하게도 이 도시가 낯설기보다는 오히려 익숙하게 다가오던 건, 내가 서울에서 자란 도시형 인간인데다가 뉴욕이 배경인 영화를 너무 많이 본 탓이었을 것이다. 나는 뉴욕이라는 새 애인에 취해서, 해가 지기만하면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는 친구들에게 오페라, 연극을 보구 와서는 스스로 영웅이 되어 자랑 섞인 보고를 하며 우쭐했었으니... 그리고 내후년 졸업하면 , 나는 뉴욕에서 나의 길을 닦으리라는 결심을 했다.
Wonsook Kim, Heart Full of Images", 22x28 inches Ink and Charcoal on paper 1984
뉴욕은 여러 작은 마을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 그 위 곳곳의 동네마다 나의 낡고 빛 바랜 옛날 사진들이 이 작고도 거대한 섬을 덮고 있다. 힘들었던 날들까지도 다 귀한 추억들이 되어, 빛이 바랠수록 기억은 선명하게 되는 사진들처럼 네이버후드 마다에 나만의 현수막이 되어 걸려있다.
처음 도착 해서 살았던, 그땐 무시무시했던 트라이베카 워렌 스트릿, 22가, 37가, 184가, 142가, 12가 지금의 24가… 수없이 이사 다니던 이유를 생각해본다. 혼자였다가 둘이 되었다가 얘들까지 넷이었다가 줄줄이 오게 된 동생들과 그 가족들로 여럿이었다가 얘들도 다 크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가 하는, 변하는 가족숫자 이기도 하지만, 더 분명한 공통분모는 돈이었던 것 같다. 돈이 모자라 쫓겨나고, 돈이 겨우 좀 생기면 방 하나를 늘리고 하는 일이 계속된 거다.
혼자되어 갈 곳이 난감하던 때에 친구의 소개로 22가의 유명한 화가 잭 트워코프의 화실에서 그가 여름 휴가 간 동안 집 봐주는 사람으로 지낸 적이 있었다. 여름 동안 열심히 온갖 일을 닥치는대로 해서 돈을 모아 방하나를 얻을 계획이었지만, 쉴 틈 없이 메인주 휴양지에서 전화로 온갖 심부름을 시키는 집주인 노 화가덕분에 찬바람이 불 때까지 집도 돈도 없는 난감한 시간이 있었다. 공짜가 없는 세상, 맨해탄 가득한 빌딩들을 보며 이렇게 방들이 수십 백만이 되는 곳에 내가 발 뻗을 공간 하나를 얻을 수 없다는 게 참 신기하기까지 했었다.
뉴욕은 거대한 바다 같아서 열심히 헤엄치며 이 바다의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지만, 지치고 힘들어져 손을 잠시라도 놓게 되면 이 거대한 물결에 잠겨버리게 되는 것 같다. 뉴욕이라는 힘차고 싱싱한 기회의 무대를 최대한 누리고 사는 이와 뉴욕이라는 큰 괴물에 자기의 영혼까지 먹혀버리는 슬픈 사람들이 엉켜사는 찬란하고도 어두운 섬.
이 섬에서 생긴 이야기들을 쓰게 되는 건 마감 날짜라는 강력한 촉진제를 곁들여 계기를 마련해주는 숙희씨의 열정과, 이젠 세월이 주는 만만한 축복 덕분이다. 재미있어야 할텐데…
 김원숙/화가
김원숙/화가부산에서 태어나 홍익대 재학 중이던 1972년 도미해 일리노이주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6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여인과 자연을 모티프로 여성으로서의 삶과 그리움, 신화적인 세계를 담아 세계에서 전시회를 열어온 인기 화가. 뉴욕과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을 오가며 살고 있으며, 2011년 '그림 선물-화가 김원숙의 이야기하는 붓'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