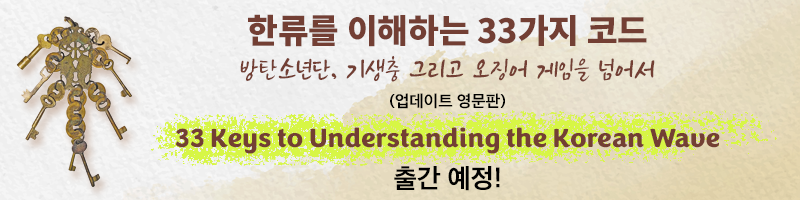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12) 김원숙: 단추공장 옆 작은 방
이야기하는 붓 (3)
단추공장 옆 작은 방
뉴욕은 낮, 밤, 그리고 새벽의 풍경들이 아주 다르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도시답게 모습이 바뀔 뿐 항상 움직이는 에너지를 지닌 것이, 죽은 듯 조용한 잠을 자는 여느 곳과는 다르다.
Wonsook Kim, "West Side" 22x38 ink on paper, 1980
여기저기 날품을 팔듯 기거하던 날들을 벗고, 맘이 맞는 룸메이트 화가 언니를 만나 37가와 8에브뉴에 있는 무서울 정도로 큰 공장 건물에 꼭대기층 한구퉁이 방을 얻었다. 양 옆이 단추, 쟈크등을 대량 취급하는 공장이어서, 낮엔 대강 살결이 검은 쪽의 사람들과 얼굴 양 옆에 꼬부랑 애교머리를 늘어트린 까만 모자의 뚱보 아저씨들이 하루 종일 붐비는 곳이었다.
우리가 적당히 간이 화장실과 방 둘을 칸막이로 하고 화구랑 침구를 풀은 쪽방도 그 공장의 일부였을 것이다. 한쪽을 막아 우리에게 세를 놓은 건 공장 사정이였는지, 아니면 밤에도 집 보는 강아지들이 필요한 거였는지는 모를 일. 상업 빌딩이라서 사람이 사는 건 불법이니 서류상 용도는 화실이었고, 밤새 그림 그리다가 잠시 잠을 자게되는 건 누가 어쩌겠냐는 식의 엉터리 계약조건이었다.
하루 종일 기계 철컥거리는 소리와 수천 개의 단추들이 좌악좌악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위엔 쉴새 없이 떠드는 스패니쉬 아줌마들의 높은 언성에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어도 별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그러나 기차길옆 오막살이 아기도 잠을 잘 자듯, 곧 그 소리들도 멀어졌고, 옆 창으로 보이던 매일 다른 색깔의 허드슨 강의 풍경만 짙어져 갔다. 게다가 나는 프리랜서로 백화점 쇼윈도를 장식하던 때여서 낮에 일하는 날이 많았지만, 밤일을 하는 룸메이트 언니에겐 더 고역이었던 우리 집.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면 갑자기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하루 종일 세던 단추더미들은 그대로 쌓아놓고 시계바늘에 맞춰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요정들처럼. 아니, 시계가 울리면 모두 정지되어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가 아침 8시가 되면 일제히 녹아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해가 지면 그렇게 복작대던 거리가 스산해지고, 하루 종일 전 재산이 들어있는 손수레를 밀고 다니던 홈리스들이 정문이 조금 들어와서 달려있어서 강바람을 피할 수 있는 우리 빌딩 앞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내가 좀 늦게 집에 오거나 새벽에 나가야 하는 날에는 잠자는 거지들을 밀어대면서 문을 열어야 했고, 때로는 술 취한 몇을 깨워가며 건너 건너 들어와야 했었다.
좀 지나서는 얼굴이 익은 베티 할머니와 인사를 나눌 만큼 되었는데, 그녀는 언제나 똑같은 빈 깡통이 가득 들어있는 커다란 플라스틱 자루를 항상 밀고 다녔다. 빈 깡통들을 돈으로 바꾸는 거 보다는, 큼직한 자루 가득을 갖고 있다는 게 그녀에게 든든했던 것. 그래도 나는 어쩌다 이렇게 길에서 자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았다. 나도 집을 찾을 땐 이러다 홈리스가 되는 건가 겁이 난 때도 있었고,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우리 쪽방에라도 데리고 들어오는 엄청난 일이 생길까봐서.
그러나 그렇게 절박한 곳도 별로 불편한 줄 몰랐던 것은, 내게 피곤을 모르는 젊음이 었었고, 나도 그 거리를 살아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모두만큼 무엇보다 생존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하루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 붉게 지는 햇살을 업고 천천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는 것, 이 모두가 얼마나 소중하고 거의 성스럽기까지 한 것을 깊이 배웠다. 그 때의 그림들에는 이런 절박한 삶의 소중한 그림자들이 짙게 깔려있다. 이 또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젊음의 아름다운 뒤안길이다.
 김원숙/화가
김원숙/화가
부산에서 태어나 홍익대 재학 중이던 1972년 도미해 일리노이주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6년 뉴욕으로 이주한 후 여인과 자연을 모티프로 여성으로서의 삶과 그리움, 신화적인 세계를 담아 세계에서 전시회를 열어온 인기 화가. 뉴욕과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을 오가며 살고 있으며, 2011년 '그림 선물-화가 김원숙의 이야기하는 붓'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