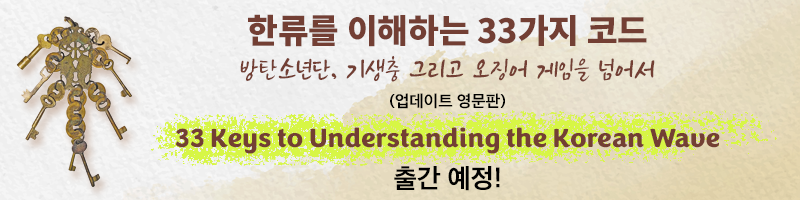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45) 이수임: 바다가 부른다
창가의 선인장 (4)
바다가 부른다
인간은 정녕 물에서 왔을까?
남편은 나를 ‘바다에 미친 여자’라고 한다.

Soo Im Lee, Soul 113, 2013, acrylic on canvas, 14 x 14 inches
롱아일랜드 존스(Jones) 비치를 지나서도 한참을 더 가면 로버트 모세(Robert Moses) 비치가 있다. 모세 비치에서도 화이어 아일랜드로(Fire island) 가는, 등대 가까운 바닷가에 나는 즐겨간다. 바닷물이 여름 내내 데워진 늦여름 화창한 날, 바다가 부르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빈 속에 소주 한잔이 들어가면 갑자기 붕 뜨는 기분과도 같다고 할까?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면 파도는 나를 살짝 들어 올렸다 사뿐히 내려놓는다. 몸이 들여 올려질 때 오는 희열, 떨어지면서 발끝에 닿는 모래의 포근함이 흥겨워 파도를 탄다.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길 기다리며 놓칠세라 준비자세를 취하면 순식간에 솜방망이에 맞은 듯 붕 떴다가 떨어지고를 반복하며 파도에 취한 몸은 축 늘어진다. 슴슴한 오이지 담기에 알맞은 바닷물에 절여져 여름 내내 모기에 물린 상처는 아물어가며 다음 여름을 기다린다.
가도 가도 끝날 것 같지 않은 백사장과 만나는 파란 하늘은 하얀 등대 곁을 지나가는 구름 위에 나를 태우고 멀리멀리 어린 시절로 끌고 간다. 채찍질처럼 들리던 파도소리의 반복적인 리듬은 엄마의 자장가로, 엄마의 손길 같은 따스하고 잔잔한 바람결에 나는 모래 팔베개를 베고 스르르 잠이 든다.
여름 내내 잘 구워진 갈색의 중년 여자가 옷을 홀딱 벗더니 V자 팬티만을 입고 우리 앞을 지나 바닷물에 들어간다. 브래지어도 하지 않은 알몸으로. 안경을 찾아 꼈다.
동성연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줄무늬 천 간이 막이 여기저기 보인다. 벌거벗은 사람들이 드문드문 서성거리고 담소하며 늦여름 바다를 즐긴다. 옆 망사 텐트 안의 아줌마는 아예 다 벗고 낮잠에 빠졌다.
“뭘 안경까지 끼고 열심히 보는데, 대학 시절 허구한 날 실기실에서 누드모델과 함께 보냈으면서. 새삼스럽게.” 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듯 남편이 한마디 한다.
옷을 걸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화려한 색상의 수영복이 눈에 거슬린다. 벗겨진 인간이 파란 하늘 밑의 모래나 바람 그리고 파도와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자연의 한 일부분으로 시들해졌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생각에 잠긴다.
그런데 바닷물은 왜? 어떻게 이리도 짠 것일까?
 이수임/화가
이수임/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