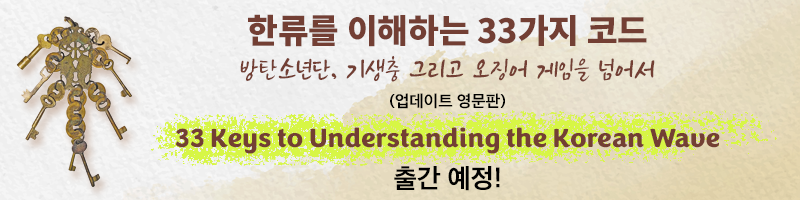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60) 한혜진: 이모님 만들기
에피소드 & 오브제 (11) 이모님 만들기
외로움, 그리움 보상해주는 이국 땅 이모님들
고모와 비슷하지만, 이모가 다른 점은 고모는 때로 위한답시고 문제를 새롭게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이모는 모른척하며 비방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란 점이다. 알면서도 모른척, 이것만큼 하기 힘든 것도 없는데, 이모는 이점에 있어서 베테랑이며 소리없는 지지자인 것이다.

이영철, 사랑으로 가는 길, 25.8x18cm, Acrylic on Canvas. 2014
이 세상에는 이모라는 존재가 있다. 만약 엄마의 동기 간에 남자 형제들만 있다면, 이모를 가질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처럼 칠팔남매의 자식들이 생겨나던 시절이 있었기에, 대부분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에겐 한 두 명의 이모가 있게 마련이다. “신이 세상 모든 곳에 임할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는 말이 있는 걸 보면 어머니는 아마 신의 대체품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모란 엄마의 닮은꼴쯤 되지 않을까? 엄마의 모난 부분을 둥글게 만든.
나는 여러명의 이모를 가졌고, 지금은 같이 늙어간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맏이로 태어난 나에게 그들은 때로는 언니같은 존재요, 스스럼 없는 대화가 가능한 상담자요, 내가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생생한 케이스 스터디의 주인공들이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보면 이모들과 친하게 지낸것이 사실이다. 특히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몇몇 이모들과는 특히 그렇다. 막내 이모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같은 노선을 다니는 다른 번호를 가진 버스처럼, 이모와 나는 미국 이민을 택했고 가까이 살고 있다. 마음이 외로울 때나 알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내가 즐겨찾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점이 항상 고맙다.
내 기억의 필름 속에서 지워지지않는 영화가 한편 있는데 그 제목은 ‘진고개 신사’이다. 당시 영화에 심취했던 여고생인 네째 이모가 하교 길에 우리 집에 들렀던 차에, 영화 구경에 나를 끼워넣기 해준 덕분이었다.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나는 엄앵란, 김진규 주연의 사랑하고 울고 불고 하는 어른용 영화를 느긋하게 보았던 추억이 새롭다. 이모라는 존재의 비호 속에서. 이모라는 존재가 좋은 것은 눈치가 안보인다는 점일게다. 봐주고, 눈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일단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을 주는 존재가 이모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때로는 엄마한테 얘기하면 펄펄 뛸 이야기도 이모에게 먼저 슬쩍 건네서 해결책을 찾기도 했었다. 고모와 비슷하지만, 이모가 다른 점은 고모는 때로 위한답시고 문제를 새롭게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이모는 모른 척하며 비방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란 점이다. 알면서도 모른척, 이것만큼 하기 힘든 것도 없는데, 이모는 이점에 있어서 베테랑이며 소리없는 지지자인 것이다.

집에 오자마자 열어 본 꽈리고추멸치 볶음. 누른 밥이랑 먹으면 딱이겠다. 늘 그 분은 만날때마다 뭔가 선물을 주시곤 한다. 그것도 늘 손수 만드신 것으로. 사람의 관계도 고소하고 달달해야함을 일깨워 주신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from Facebook-
내 보통 때의 생각이 이래서인지, 소설가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을 읽다가 슬며시 웃음이 새어 나온 적이 있다. 작가가 천주교에 귀의하고, 유럽 곳곳의 수도원을 방문하며 쓴 글에는 수녀님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그런데, 작가가 조카가 된 듯, 수녀님을 묘사하는 여러 대목에서 나도 느끼고 있던 그런 이모님의 모습이 자주 묻어 나오는 것이었다.
결국 다음과 같은 표현에 다다랐을 때, 나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국이 있다면 혹 이런 느낌은 아닐까? 짧은 인연, 상대방이 잘된들 나에게는 아무런 댓가가 없는 인연에도 지극히 마음을 쏟아주는, 그래도 당신들에겐 아무런 보탬도 뺄것도 없어서 결국은 보탬이 되고야 마는 그런.” 미국에 처음 올 때는 이렇게 혼자 달랑 떨어져서 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부모님도, 동생들도 그렇게 멀리 두고서 말이다.
이런 나에게 알게 모르게 한가지 버릇이 생겼다면, 내 나름대로 이모님을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부모님은 한 분 뿐이지만, 이모는 많을수록 좋지 않은가? 그 분들한테 직접 이모라고 부르지는 못해도 나 혼자라도 이모님을 대하듯 지낸다. 그리고는 나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한 보상을 받곤 한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때 느끼던, 공감대가 순하게 겹쳐지는 순간이 주는 기쁨을 말하고 싶다.
나름대로 가파른 길을 지나오신 분들이시지만, 너그러움과 배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남을 위해 발품을 팔 줄도 아시며, 끌어안기 위해서는 자신의 팔을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신다. 물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런 사실을 새록 새록 마음에 새겨야 함은 나 또한 조카이면서도, 이모인 까닭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모님의 것과 비슷한 웃음을 지녀야 할 나이에 도달한 때문이다.
마치 노래가사와 같은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을의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옛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이 긴 이야기를 듣는가?” 만약 어머니라면 가사처럼 “묻지도 말아라 네 일랑은” 하며 타박을 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모라면 금방 오케이를 할 것이다. 꼭 이모가 아니라도 평소 때 이모님의 웃음을 간직하고 계시던 분께라도 청을 해보자. 가벼운 점심식사에 따끈한 차라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웃음과 이야기가 있는 가을, 쓸쓸하지만은 않을 것같다.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후 결혼, 1985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한양마트 이사로 일하면서 김정기 시인의 권유로 글쓰기와 연애를 시작, 이민 생활의 균형을 잡기위해 시와 수필을 써왔다. 2011년 뉴저지 리지필드 한양마트에 갤러리1&9을 오픈, 한인 작가들을 소개했으며, 롱아일랜드 집 안에 마련한 공방에서 쥬얼리 디자인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