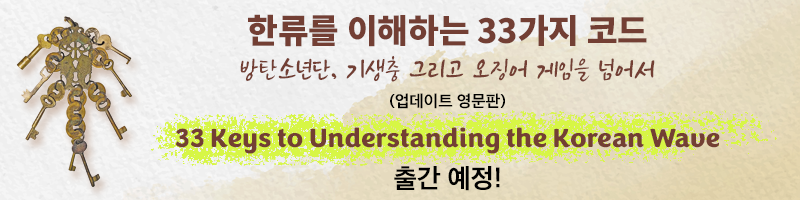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120) 필 황: 뉴욕 경찰은 택시요금도 받아준다
택시 블루스 <11> 친절한 NYPD
미국 경찰은 택시 요금도 받아준다

10월 5일 오전 11시 경 메트로폴리탄뮤지엄 앞에서 두 여성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준 경찰관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지난 일요일 새벽 0시 45분이었다. 보통 주말과는 달리 거리는 한산했다. 주말 경에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날 것이라는 예보가 주초부터 있었다. 정작 허리케인은 이쪽으로 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주말 약속을 모두 취소한 듯 했다.
렉싱턴 애브뉴 83가를 지나는데 젊은 남자 손님이 택시를 세웠다. 그는 타자 마자 "강을 건너가자"고 했다.
"뭐?"
"강을 건너가자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재차 물었더니 그제서야 윌리암스버그로 가자고 했다.
이때 눈치를 챘어야 했다. 정확한 주소나 거리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것이 실수였다.
다리 건너가서 물어보면 되겠거니 한 것이다. 평소와 달리 너무 손님이 궁했던 탓도 있었다.
그는 말을 마치자 말자 뒷자리에 누워 잠을 잤다. 이런 경우 내가 원하는 경로로 좀 더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
FDR 드라이브를 타고 강변을 따라 내려가 윌리암스버그 브릿지를 넘었다. 이제 손님을 깨워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봐야 할 시간. 차를 세우고 몇 번 불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뒷문을 열고 흔들어도 봤지만 꿈쩍 않았다. 아뿔사 이제서야 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좁은 택시 뒷 좌석에서도 제 안방마냥 퍼질러 자는 것이다. 눈을 뜨는듯 했지만 이내 잠이 들었다.
이때는 경찰의 힘을 빌리는 것이 상책이다. 나는 Waze 앱을 이용해 주변에 경찰이 있나 살펴봤다. 멀지 않은 곳에 경찰이 있다는 표시가 있어 갔더니 실제로는 없었다. 구글맵을 이용해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했다. 5분 거리에 있었다.

이 경찰관은 메트뮤지엄 계단에서 두 여성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친절함'을 보였고, 그들은 경찰과 기념촬영을 했다.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우니 마침 젊은 경관이 경찰서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을 구했다. 경관은 내 설명을 듣더니 손님을 깨우기 시작했다. 요지부동이었다. 마침 차로 근처를 지나던 남녀 경관도 합류했다. 손님의 얼굴에 후레시 라이트를 비추며 그를 세게 흔들어 댔다.
간신히 깨워 차 밖으로 끌어내니 그는 여자친구라도 되는냥 팔로 여자 경관의 어깨를 둘렀다. 미모의 젊은 여경은 기가 막히는지 피식 웃었다. 경찰관들은 그에게 요금을 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그는 횡설수설할 뿐이었다.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눈치였다. 경관들이 그의 몸을 뒤졌지만 그에게는 지갑도 전화기도 없었다. 맙소사. 이때부터 경관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나는 돈 받기는 글렀구나 생각했다. 지금까지 두어차례 요금을 떼인 적은 있지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33.30나 나온데다 시간도 꽤나 들었다. 경관들은 내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그를 추궁했다. 그 정도면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나는 재수 없었던 하루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작정이었다.
처음 만난 젊은 경관이 내게 오더니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서에 들어가 리포트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하지 않고 그냥 가도 된다고 그것은 내 자유라고 했다. 내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경관은 신분증을 들고 들어오라 했다. 시간 얼마 걸리지 않는다고. 알겠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손님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다. 저 친구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를 택시를 탄 탓에 수갑까지채이고 유치장에서 밤을 새겠구만.
여경관은 택시 요금 영수증, 운전면허증, 택시면허증을 내게서 받아 복사한 후 돌려주었다. 여경관과 그의 파트너는 다시 일을 나갔다. 얼마 뒤 젊은 경관이 내게 오더니 전화번호를 물었다.
"아침에 검사가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서야 그 경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여유가 있었는데 영화배우처럼 훈남이었다.
같은날 오전 10시 경 정말로 담당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서 손님을 태웠습니까?"
"어퍼 이스트에서요. 렉싱턴 80 몇가 됩니다."
"어퍼 이스트요. 손님이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윌리암스버그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를 깨운 곳은 어디입니까?"
"윌리암스버그 브릿지 넘어서 입니다. 깨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온 것이고요? 그런 경우 그렇게 조치하도록 돼 있어서죠?"
"맞습니다."
"요금은 33달러 30센트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후 경과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다.
요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될 지, 실제로 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른다. 하지만, 떼인 택시요금을 받는 절차까지도 제도화돼 있는 미국사회에 대해 새삼 놀란다. 그 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친절한 태도도 인상 깊었다. 내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손님이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나 다른 유색인종이었다면 어떠했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필 황/택시 드라이버, 전 뉴욕라디오코리아 기자
필 황/택시 드라이버, 전 뉴욕라디오코리아 기자1960년대 막바지 대구에서 태어나 자라고 19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닌 486세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독립영화, 광고, 기업홍보 영상, TV 다큐멘터리, 충무로 극영화 등 영상관련 일을 주로 했다. 서른살 즈음 약 1년간의 인도여행을 계기로 정신세계에 눈뜨게 된 이후 정신세계원에서 일하며 동서고금의 정신세계 관련 지식을 섭렵했다. 2007년 다큐멘터리 영화제작 차 미국에 왔다가 벤처기업에 취업, 뉴욕에 자리를 잡았다. 2010년부터 뉴욕라디오코리아 보도국 기자로 활동했으며, 2013년 여름부터 옐로캡 드라이버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