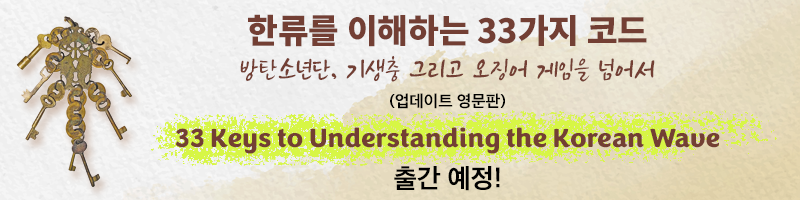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188) 스테파니 S. 리: 누구를 위한 아트 페어인가?
흔들리며 피는 꽃 (13) 미술의 상품화
누구를 위한 아트 페어인가?

지금은 없어진 Fountain Art Fair 2014. Photo: Stephanie S. Lee
문화의 도시답게 뉴욕에는 수많은 유명 미술관들이 있다. 미술에 관한 이벤트도 많아서 매년 3월이면 아모리 쇼를 시작으로 많은 미술관련 페어들이 수십개씩 열린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화랑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잘한다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서 며칠동안 보여준다. 단기간에 많은 수의 작품들을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볼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작품을 한꺼번에 보는것이 좀 버겁다.
수준높은 다양한 작품들을 구경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긴 하지만 단시간에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보려니 몸과 마음이 분주하고 눈이 피로하다. 어느 정도 검증되어 선택받아 나온 작품들이라 하나하나 보면 다 좋은데 수많은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란히 놓이니 비교할 수 없는 장르의 작품들도 어쩔수 없이 경쟁구조, 수직구조에 들어가 비교의 대상에 오른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작품들도 점점 더 자극적이고 상품성있게 바뀌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작가들은 전시용 작품과 페어용 판매 작품을 아예 구분해서 제작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적응이 잘 안된다. TPO에 적절히 맞출줄 아는 센스는 참 중요하지만 작품까지 여건에 따라 바꾸자니 자아분열이 오는듯한 기분마저 든다. 돈 벌자고, 많이 팔려고 그림을 시작한건 아닌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다른 작품들에 비해 눈에 띄어 잘 팔릴까? 어떻게 하면 작품의 단가를 낮출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자니 나는 과연 작품을 만드는 사람인가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혼란스럽다. 대중의 요구에 빠르게 발맞춰 작품을 상품화시키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그것은 대중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일까? 아직 잘 모르겠다.
페어 측은 전면으로는 관객들에게 다양한 작품들을 모아 보여주고, 작가들에게는 판매의 장을 제공해줌으로서 미술의 대중화,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미술시장의 활성화라는 한마리 토끼만 잡는다고 해도 참 좋겠지만 실상은 판매가 부진한 부스가 대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부담은 곧 비용을 지불하고 수익은 보장받지 못하는 아티스트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아티스트들의 쌈짓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부스 렌탈비용과 입장료로 수익을 올리는 주최자 하나 뿐인 것 같다. 그러니 일반 갤러리들은 줄어드는 와중에도 아트페어들은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에 모이니까.

Art Expo 2016. Photo: Stephanie S. Lee
페어가 끝난 후에 화제가 되는 것 역시 어떤 좋은 작품들이 전시되었는가 보다는 얼마에 팔리고 몇개나 팔렸나 하는 사실들이다. 애초에 판매를 목적으로 열린 것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억대 경매니 최고의 낙찰가니 하는 류의 기사들이 심히 불편하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열심히 읽고 있는 내 자신은 더 싫다.) 기왕이면 작품 감상이라도 할 수 있게 작품사진이라도 한장 같이 실어주는 성의라도 보이면 좋으련만 작품사진은 보이지도 않고 숫자만 보이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쏠린다. 언제부터 문화를 평가하는 척도마저 돈이 되었는지... 잘 팔리는 그림, 비싼 그림이라고 다 좋은 그림은 아닌데 말이다.
많은 대중들에게 작품을 노출시키고 그 반응을 한번에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 다른 작가들의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은 아트페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잇점이다. 하지만 아트페어란 구조가 한 작가의 이야기를 심도있게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어쩌면 패스트 푸드 점에서 설렁탕을 찾듯 엉뚱한 곳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내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여하튼 모든 것들에 속도가 관건이 되어버리는게 못내 아쉬운데 이제는 예술분야 까지 그래야 하는 건가 싶어 씁쓸하다. 좀 더 많고 다양한 것을 짧은 시간에 보고 싶은 것이 대중의 마음이겠지만 그렇다고 베토벤의 교향곡과 재즈, 팝송들을 한번에 모아 빨리 듣기 하진 않지 않은가. 같은 색이라도 아침에 보는 것과 저녁에 보는 것은 다르고 한폭의 그림 속에 무수한 시간이 쌓였듯,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감동의 깊이도 있는 법이다.
 Stephanie S. Lee (김소연) / 화가, 큐레이터
Stephanie S. Lee (김소연) / 화가,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