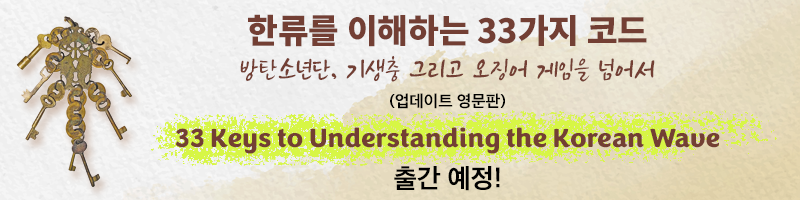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194) 허병렬: 아날로그 언어의 부활
은총의 교실 (8) 기계보다 사람이고 싶다
아날로그 언어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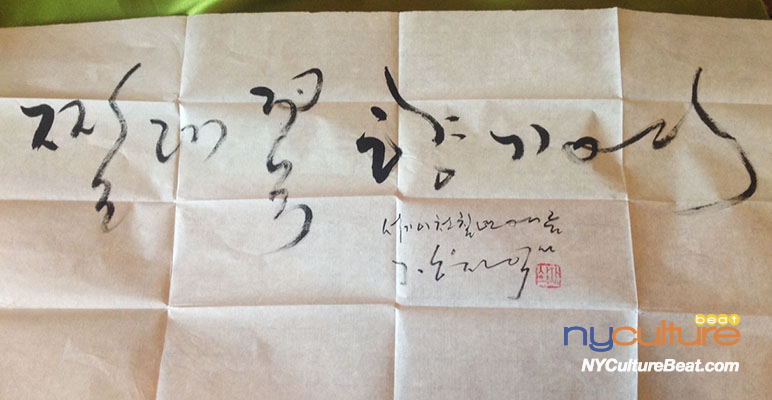
가수 장사익님의 필체 '찔레꽃 향기'
생활문화가 바뀌면서 말들이 이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돌싱’이라니? 그게 돌아온 싱글, 즉 이혼하였기 때문에 다시 싱글로 돌아왔음을 뜻한다는 설명이 그럴듯하다. 하여튼 이 말이 밝은 생활관을 보여줘서 다행이다. 이렇게 긴 말을 짧게 축소한 말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새 낱말을 만든 것도 있다. ‘집밥’이나 ‘손글씨’ 같은 말을 가리킨다. 이 말들은 일상생활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집밥’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하든지, 혼자 식사를 하든지 ‘집에서 하는 식사’를 가리킨다고 본다. 왜 이 일이 특별한 것으로 취급되는가. 즉, 요즈음의 생활이 밖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그래서 생활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긴가. 아니면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뜻인가.
‘집밥’이 주는 인상 그것은 따뜻함, 소박함, 순수함, 가족애, 대화 나눔…등을 연상케 한다. 음식을 사서 먹는 매식의 인상은 간편함, 시간 절약, 의무, 습관…등 즐거움보다는 빠뜨릴 수 없는 하루의 일과라는 느낌을 준다. 매식이 습관이 되면 쉽게 ‘혼밥’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식사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생활관이나 인성이 바뀐다지만 요즈음 흔히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
‘손글씨’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원래 글씨는 손으로 쓰는 것인 줄 아는데... 손글씨는 컴퓨터 자판의 글쇠를 눌러서 쓰는 글씨와 구별하는 말이다. 즉 개성이 없는 기계 글씨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각자가 제각기 다른 글씨체를 가진 손으로 쓴 글씨를 가리킨다.
어쩌다 손글씨의 문장을 보면 반가워서 눈을 번쩍 뜨게 된다. 그것이 어떤 글씨든 정다움을 느낀다. 특히 편지나 문예작품 시는 손글씨가 좋지만 보기 드문 일이 되어버렸다. 어디선가 김 훈 작가는 원고지에 또렷한 연필 글씨로 작품을 쓴다는 글을 읽은 듯하다. 그 손글씨를 꼭 한 번 읽고 싶다.
이상한 것은 기계문화가 만발한 요즈음 왜 이런 말들이 뚜렷하게 새로운 자리를 잡았을까. 어떠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잃은 것들을 되찾으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만일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H님 댁 점심식사
H님 댁 점심식사
이러한 말의 변화를 보면 우리는 인간이고 싶다는 것이다. 서로 다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다.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살고자 한다. 그런데 세상은 온통 디지털화, 기계화되면서 인간성이 거기에 휩싸였다고 느끼게 된 것이 아닌가. 그 표현도 순수한 한국말 ‘집밥’이나 ‘손글씨’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다. 거기에 새 것을 주면, 손에 들고 있던 한 가지를 떨어뜨리고, 그 손에 새 것을 쥔다. 그리고 손에 든 물건들을 살피다가 떨어뜨린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해 양손에 든 한 가지는 체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람들은 새 것만 쫓다가, 헌 것의 값어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고 싶다는 것이 분명하다.
세상의 변화에 예민한 것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이다. 따라서 생활 용어를 보고 그 시대상을 알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한국어생활은 한국내와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기본이 되는 말을 가르치고 그 말들을 사용한다. 말하자면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뜻한다. 자녀를 데리고 가게에 갔을 때 자녀가 제 이름도 똑똑하게 대답하지 못 했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었다. 가게에서는 “너, 이름 뭐야?”하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한 것이다. 학교에서는 “이름이 무엇이에요?”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하던 어린이였는데.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일은 새로운 세계의 창문을 여는 것이다. 그것이 내 부모의 언어일 때는 그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나 자신을 찾는 일이고, 확대하는 일이다. 이런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흉내말 놀이’처럼 재미있는 게임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이다. 여기는 한국내 새내기 낱말과는 거리가 멀다.
 허병렬 (Grace B. Huh, 許昞烈)/뉴욕한국학교 이사장
허병렬 (Grace B. Huh, 許昞烈)/뉴욕한국학교 이사장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성여자사범학교 본과 졸업 후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1960년 조지 피바디 티처스칼리지(테네시주)에서 학사, 1969년 뱅크스트릿 에듀케이션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음. 서울사대부속초등학교, 이화여대 부속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1967년부터 뉴욕한인교회 한글학교 교사, 컬럼비아대 한국어과 강사, 퀸즈칼리지(CUNY) 한국어과 강사,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뉴욕한국학교 교장직을 맡았다. '한인교육연구' (재미한인학교협의회 발행) 편집인, 어린이 뮤지컬 '흥부와 놀부'(1981) '심청 뉴욕에 오다'(1998) '나무꾼과 선녀'(2005) 제작, 극본, 연출로 공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