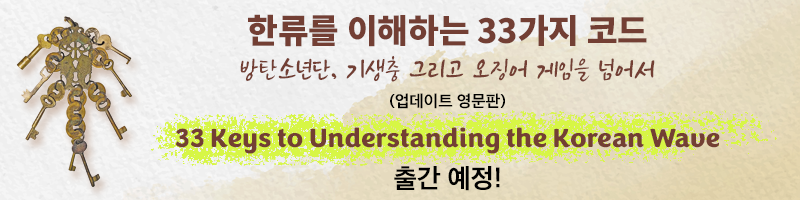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300) 스테파니 S. 리: 나쁜 딸 모놀로그
흔들리며 피는 꽃 (31) 깨진 그릇
나쁜 딸 모놀로그

Stephaine S. Lee, Cabinet of Desire III, 2017, Natural mineral pigments and ink on Korean mulberry paper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게 지나간다. 오늘도 지칠대로 지쳐 들어오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소포가 되돌아 갔으니 우채국으로 와서 찾아가라는 노트가 와있다. 다른 소포들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앞에 두고 가는데 한국에서 오는 소포는 늘 이런 식이다. 그렇게 부치치 말라고 했는데 엄마는 또 소포를 부친모양이다.
복잡한 우체국안에서 한참을 기다려 찾아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내용물에 비해 소포비가 훨씬 더 비싸다. 무슨 말인지 모를 의미없는 영어 단어가 옷마다 가득하고, 옷에는 하나같이 주렁주렁 뭐가 달렸다.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내 눈에는 재앙 수준이지만 그래도 7살 딸은 할머니랑 취향이 비슷해서 좋다고 입어본다. 한참 있다가 셔츠에 써있는 Wednesday 와Thursday의 스펠링 틀렸다며 학교에는 못입고 가겠다고 했지만…
엄마와 나는 식성부터 취향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엄마는 자꾸 나한테 본인 취향의 물건을 사다 안긴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여기에도 다 있으니 제발 제 물건은 사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물건을 사 보내신다. 게다가 어떤 물건이든 하나만 사는 법이 없는지라 한개도 아니라 여러 개를 보내신다. 택시비는 아끼면서 왜 이런 쓸데 없는데 돈을 쓰시는 걸까 몹시 화가난다.
 T shirt from Grandmother
T shirt from Grandmother
물건을 사는 사람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물건을 떠안는 부담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된다. 물건을 버린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단단히 마음먹지 않으면 아무리 쓰지 않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라도 망가지기 전에는 꼬리를 무는 미련들 때문에 매몰차게 버릴수가 없다. 안그래도 집에 처리해야 할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거기에 더해 정리하지도 못할 물건들을 또 잔뜩 받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이번엔 물건을 가득 들고 엄마가 직접 오셨다. 전시차 타주에 2박 3일동안을 가 있어야하는데 아이 개학일이랑 겹쳐버려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의 편은 믿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애를 학교 첫날부터 빠지게 하고 데리고 갈 수도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이왕 오실거, 우리가 필요로할 때 오세요”하며 엄마를 불렀다. 나쁜 딸이다.
공항에 마중나가 기다리는데 한참을 안나오신다. 또 짐이 많아 문제가 생기는 건가… 불안해 하고 있는데 엄마 또래 중년부인이 커다랗게 ‘기장미역’ 이라고 써있는, 첼로통보다도 더 길어 보이는 미역 박스를 짐 위에 얹고 나오신다. 어색하게 젊은 남성과 인사하고 함께 나서는걸 보니 아마 딸이 출산을 한 모양이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저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다… 안도하는 찰나, 그럼 그렇지… 미역박스 못지않게 큰, 카트를 꽉꽉 채운 짐들을 밀며 엄마가 나오신다. 엄마의 가방들은 늘 엄마처럼 뚱뚱하다. ‘저걸 또 어떻게 다 들고 오신거야…’ 나는 또 화가나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몇시간을 날아 온 엄마한테 대뜸 잔소리부터 해댄다. 정말 나쁜 딸이다. 하지만 어쩐지 마음과는 다르게 엄마를 보면 자꾸만 화가난다.

Kintsugi: Mishima ware hakeme type tea bowl, with gold lacquer kintsugi repair work (right), 16th century Photo: Wikipedia
일본에선 이가 나간 그릇이나 깨진 그릇을 이어붙여 쓰는 킨츠키(Kintsugi) 라는 풍습이 있다고 한다. 결함을 숨기지 않고 깨진 부분을 금이나 은 등으로 메우며 원래 모양대로 복원해 쓰는데, 수선된 그릇들은 저마다 독특한 사연을 품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특별히 여긴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귀한 손님은 이빠진 그릇으로 대접한다고 한다. 지저분하고 낡은 다기들을 세월이 배어든 역사의 증명이라고 생각해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지금껏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 이란 노래의 가사 처럼 흉터가 남은 그릇들은 못쓰게 되었다고 생각해 죄다 버리며 지낸 것 같다.
나는 조금이라도 이가 나간 그릇은 못보는 성격이라 깨진 그릇들은 얼른 치워버리며 살았다. 성격이 급한데다 복잡한 걸 싫어해서 인간관계에서도 내편이 아니면 적,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단정지으며 지내왔는데 살아보니 아무리 금이 가고 이가 나가도, 심지어 깨졌어도 버릴수 없는 그릇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가족. 어쩌다 한번 쓰는 귀한 그릇들이야 조심조심 다루지만 매일 쓰는 그릇들은 익숙함을 핑계로 함부로 다루게된다. 매일 쓰느라 닳고 여기저기 흉터가 있어 볼때마다 거슬리는 그릇인데도, 이 가족이라는 그릇은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화가 났다. 엄마가 나를 도우려고 부엌에서 일을 해도 화가났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화가났다. 아마도 나는 매일 쳐다보며 써야하는 이 그릇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않는 상황 자체에 몹시 분노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일본의 킨츠키라는 풍습을 보면서 깨져버려 회복할 수 없을 것 같던 관계들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어느한쪽으로 단정지어야 속편하던 인간관계의 결벽이, 세월로 메꿔지고 이어지며 그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었겠다 하며 조금씩 무뎌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화병도 8폭 병풍, 호림미술관 소장
화병도 8폭 병풍, 호림미술관 소장
우리나라 민화에도 화병이 자주 등장한다. 금이 간듯한 표현의 화병을 그려넣은 연유가 궁금했었는데 화병(花甁)의 독음이 화평(和平)과 유사하여 화합과 평안의 상징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누군가의 화평을 기원할 때 실재 화병이나 화병 그림을 그려 선물했다고 한다. 깨어짐에서 평화를, 부서진 조각에서 귀한 의미를 찾아내는 선조들의 지혜를 보며 나 역시 한층 성숙해진 인간 관계를 희망해본다.
퇴직하면 와서 아이를 봐 주겠다 하시더니 엄마는 여전히 바쁘다. 짐을 가득 안고 와 집을 어지르며 함께 지내는 것도 화가 났는데, 짧게 있다 가시니까 또 화가 난다. 그 화는 공항에서 사발면 하나로 아침을 떼우고 엄마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와서야 비로소 후회로 녹아내렸다. 잘해드릴걸… 어쨌든 별 잘난 것도 없으면서 다 큰 딸은 엄마앞에서 언제나 잘났고, 다 자란 딸 앞에서 엄마는 언제나 못났다. 성격이 더러운 딸은 앞으로 한번만 더 물건을 사보내면 되돌려 보내겠다며 엄마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있다. 엄마는 또 나에게 소포를 부쳐올 것이다.
 Stephanie S. Lee (김소연)/화가, 큐레이터
Stephanie S. Lee (김소연)/화가,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