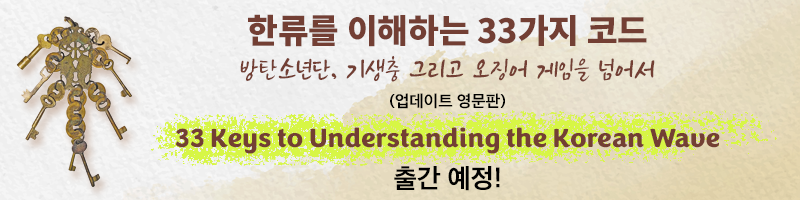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307) 스테파니 S. 리: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흔들리며 피는 꽃 (32) 두려운 것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나이를 먹는 것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다.
나이를 먹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누구나 나이는 먹는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두려웠던 것은 어느 한 시기에 달성해야할 무엇인가를 달성하지 않은 채로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먼 북소리' 중에서-

나에게도 한때는 ‘어느 한 시기에 달성해야할 무엇인가’가 있었던것 같은데 이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죽자고 사는건지, 살겠다고 죽을 힘을 쓰는건지, 먹자고 사는건지, 살려고 먹는건지 모를 요즘이다.
새벽 한시. 나는 여전히 부엌 싱크대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있다.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 한숨이 나오지만 에누리 없이 차곡차곡 쌓이는 일상의 일들은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 되로 막을것도 말이 되어 밀려온다. 어차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두배로 힘들게 할 일, 마음 편히 자려면 몸이 피곤한게 낫다.
딱히 소속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살필 자식이 줄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매일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까.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나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숨차게 하루를 보냈는데 하루가 가는 끝자락에서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남아있고, 정작 나를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몸이 꺼져들어가는 기분이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건지 집안 일 하는 요령이 부족한 건지 그릇을 씻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자정이 넘도록 여전히 싱크대에서 그릇을 씻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이건 아니지 않나… 고개를 저어봐도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그냥 살아내는수 밖에.

Death, 2013, 17 ½˝ (H) x 21 ½˝ (W) x 2 ¾˝ (D), Stephanie S. Lee, Gold & color pigment, ink on Korean mulberry paper
현모양처가 되기는 애저녁에 포기하고 사는데 밥 세끼 챙겨먹고 ‘현모’가 아닌 ‘그냥 모’ 노릇만 하기도 어찌나 진이 빠지는지 하루에도 몇번씩 부모로서의 책임과 개인의 이기심이 충돌한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부모로서의 책임이 나의 이기심보다 조금 더 버텨주지만 그 끝에 오는 것이 보람과 충만함이기만 하면 좋으련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어쩐지 억울하고 조금 손해본 기분이 든다. 양처를 포기하고 사는것에는 그다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데 스스로 잘하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 스스로를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새삼 깨달으며 자책하게 된다.
집안 일은 또 어떤가. 이사 온 지 일년이 다 되어가건만 아직도 창고며 방이며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쌓여있다. 다 갖다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자리에 놓아두지도 못할 거면서 짐을 싸안은 채 마음만 늘 무겁다.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 예전에 비해 사는 것이 월등히 편리해졌건만 어째서 시간은 더 모자라기만한 것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우물물 길어다가 기저귀 하나하나 손빨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것도 아닌데… 밥은 전기밥솥이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는 간편한 현대에도 왜 여성들은 여전히 이렇게 바쁜 것일까. 아니면 나만 이런가?

NY skyline
브루클린 쪽에서 뉴욕 시내를 보면 무덤의 비석들과 뉴욕의 빌딩들이 똑같아 보이는 지점이 있다. 환한 대낮에 화려한 뉴욕의 빌딩들과 묘지가 함께 쨍하게 시각화되어 들어오는 느낌이 묘하다. 삶과 죽음이 하나의 풍경으로 아무렇지 않게 버무려져있는 모습이 ‘성공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또 무엇이더냐, 하늘아래 다 똑같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듯 하다.
요즘 수업을 듣느라 일주일에 두번은 운전해서 맨하탄으로 가는데 막히는 차들 뒤로 길게 줄을서서 회색도시로 들어가는게 마치 그 끝이 벼랑인지도 모른채 무리 속에 휩쓸려 달려가는 양떼 무리중의 하나가 된 기분이다. 그러게… 어차피 다들 죽음을 향해 가는데 뭐하느라 이러고 바삐 달려가고 있는걸까…
성공 따위 필요없고, 무언가 달성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다 때려치우고 자유로울 용기도 없으면서 늘 바쁘다고 징징거리며, 이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아등바등 살다가 덜컥 죽음을 마주하게 될까봐 나는 그게 두렵다.
흐린 날이 잦아 그런지 반짝반짝 이쁘게만 보이던 뉴욕이 요즘 늘 회색빛이다.
 Stephanie S. Lee (김소연)/화가, 큐레이터
Stephanie S. Lee (김소연)/화가, 큐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