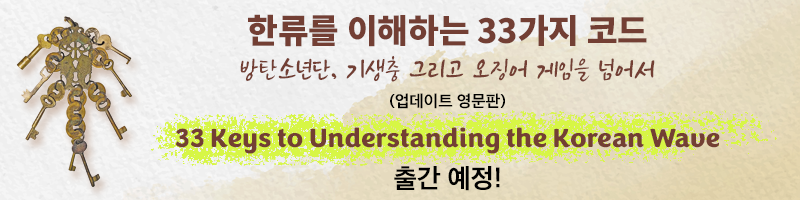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383) 연사숙: 레스토랑, 파티와 전쟁터 사이에서
동촌의 꿈 <2> 희극과 비극의 하모니
레스토랑, 파티와 전쟁터 사이에서

Ratatouille
“갈비찜 3개, 잡채 2개, 대구지리 3개, 셰프 테이스팅 6명, 채식주의자가 있으니 불고기는 따로 내도록! ”
“예스, 셰프!”
셰프의 외침은 곧 누군가에겐 파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다. 주방에서 이 외침이 많이 나올 수록 레스토랑의 활기는 솟구치고, 재즈음악에 맞춰 손님들의 대화와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간다. 백조의 모습을 호수 위에서 즐기는 손님이 있다면 그 호수 아래는 바로 작은 문틈으로 보이는 주방이다. 손님이 몰려드는 주말이면 요리사들의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모두가 예민해진다. 혹시나 주문 실수라도 생기거나 뒤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면 셰프의 목청은 더욱 높아지고, 서버들까지 호출 당하는 일도 비일 비재하다. 애니메이션 영화 ‘라따뚜이(Ratatouille, 2007)’에 나오는 그 창문 안과 밖의 모습은 실제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흡사했다. 우아하게 멋진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은 연인끼리, 가족끼리 와인과 칵테일을 즐기며 그들만의 오롯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안은 불과 칼이 나뒹굴고, 고기굽는 연기에 각종 요리기구의 알람소리까지. 그야말로 소리없는 전쟁터다.
어디에 맛집이 있고, 어떤 메뉴가 있는지 그저 찾아다니며 먹는 것만 좋아했던 내가 어느 날 그 전쟁터와 파티를 오가는 사람이 되었다니, 그것도 뉴욕에서. 가끔은 멍하니 나는 누구고 여기가 어디인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인 듯한 순간이 가끔씩 있다. 타향살이의 외로움이기도 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리울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미국생활 10년이면 이제 적응할 만도 한데 말이지. 흘러간 옛 노래 중에 “님 이라는 글자에 점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또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 버리는 인생사”이런 구절이 있다. 님과 남의 사이에 불과 점 하나라니. 무심코 찍은 점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더니, 그게 내 일인줄 차마 10년 전에는 알지 못했다.

2008년. 여름 휴가차 뉴욕에 놀러왔다 남편을 만났다. 혼자 왔기에 그저 뮤지컬이나 하나 봐야겠다는 생각에 그 흔한 관광책자 하나 들고 오지 않았다. 뮤지컬을 보고 나와 42가 타임스퀘어 역에서 나의 숙소였던 퀸즈 롱아일랜드시티로 가는 7 트레인을 찾기 위해 헤매다 남편을 만났다. 한국사람처럼 생겨서 길을 물어봤는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 와인을 마시러 갔다. 마침 출출하기도 했고, 그저 와인 한잔에 배고픔이나 달래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가던 길을 향했다. 약간 더웠던 8월의 평범한 날이었고, 그는 자기가 요리사라는 얘기를 했다. 음.. 요리가 뭔지도 모르는 나에겐 그저 신기한 일상이었고, 그의 친구들 중엔 나와 일터에서 만나는 몇명의 기자들이 있었다.
무언가 공통화제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아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런 저런 각자의 꿈에 대해 얘기하면서별 다른 의심 없이 와인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 같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이에서 이뤄진 대화는 편안했고, 그저 서로의 푸념과 일상을 나눴던 것 같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었을 것만같았던 만남을 뒤로하고 나는 다시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왔고, 한달 뒤 그는 비자를 바꾸기 위해 한국을 오며 만남이 이어졌다. 그렇게 운명같지 않았던 지하철에서의 운명은 1년뒤 나를 이곳, 뉴욕으로 데려왔다.
자의든 타의든 뉴욕의 삶은 나에게 무한한 시간을 줬다. 세상에 평등한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라더니 한국서와는 100% 달라진 삶에 적응해야 했다. 나에겐 어린 아들과 남편이 있었다. 결혼이라는 것 하나에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지도 않았던 내 오만의 결과였다. 늘 일에 지쳐 찌들어 있었던 한국의 기자생활은 마치 언제 있었나 하는 딴 세상 일 같았다. 강가에 앉아 흘러가는 강물을 하염없이 보기도 했고, 잔디에 누워 하늘의 구름을 세보기도 했다. 한국에선 1년에 한 번이나 휴가를 가면 그야말로 ‘휴가철에 즐겨야 하는 위시리스트’같은 일들이 처음엔 여유로운 사치같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하다면 지루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잠시 월가에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왔다. 시간은 흘렀고 이민생활의 노예에서 해방될 영주권이 드디어 나왔다. 영원히 아기일 것 같았던 아들은 운좋게 맨하튼의 영재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제 인생이 좀 풀리려나 하는 기쁨과 환상도 잠시, 나는 집에서 발목이 부러졌고 석달 뒤 좀 걸을만해져 간 바닷가에서 남편은 팔이 부러졌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이른바 좋은 일은 얻기 힘들고, 그것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더니. 세상도 참으로 무심하다는 생각만 들 때였다. 그래도 시간은 정확히 누구나에게 처럼 흘러갔다. 우여곡절의 사연을 지나 우리의 꿈이었던 식당을 동촌(이스트 빌리지)에 열었고, 소망했던 뉴욕타임즈의 별도 받았다. 하지만 누구나에게나 공평한 시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전쟁터와 파티를 오가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은 여전히 나의 일상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힘을 지녔기에 다른 동물과 달리 세상을 지배하고 산다. 누구나에게 희노애락과 드라마가 있고, 그 사이 희극과 비극은 누구나에게 존재한다. 어릴 적 좋아했던 유행가 가사 중에 “젊은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로 시작하는 이 노래의 2절은 이렇다. “젊은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인생길에 희극과 비극의 간극은 내 마음 속 점 하나의 차이라는 것을. 내 마음 속에 있는 나약함을 극복하는 숙제라는 사실을 말이다.
 연사숙/ 레스토랑 수길's Mom
연사숙/ 레스토랑 수길's Mom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대 경제학과, 연세대 경제대학원 금융공학과 졸업. 한국경제TV에서 9년간 경제-금융전문 기자, SBSCNBC에서 2년간 월스트릿/뉴욕증권거래소 전문 뉴욕특파원으로 일했다. 2009년 뉴욕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다니엘(Daniel) 수셰프 임수길씨와 결혼 후 뉴욕에 정착, 아들 알렉스를 두었다. 2018년 1월 이스트빌리지(동촌)에 남편과 함께 한식과 프렌치 테크닉이 만난 레스토랑 수길(Soogil)을 오픈, 뉴욕 타임스로부터 별 2개를 받았다. https://www.soog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