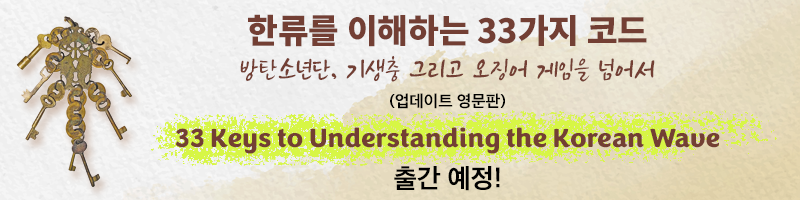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431) 이수임: 뉴욕에서 노바스코샤까지 로드 트립
창가의 선인장 (85) 뭐 까짓거
뉴욕에서 노바스코샤까지 로드 트립

미쳤지, 거기가 어디라고!
구글 지도를 보고 있다가 “가자, 노바스코샤 캐나다로” 평상시 캐나다 동쪽 끝 노바스코샤를 가고 싶어하던 남편도 “가지. 뭐 까짓거.”
우리는 즉흥 부부. 새벽 6시에 집을 떠났다. 구글 지도로는 14시간 30분 걸린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밸파스트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저녁 6시 30분, 그러니까 36시간 만에 도착했다.
온몸이 쑤시고 눈앞이 침침했다. ‘우리가 왜 이 먼 곳까지 달려왔지?’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 오긴 왔지만 되돌아갈 수나 있을까?. 여차하면 노바스코샤에서 페리에 차를 싣고 5시간 30분이면 포틀랜드로 돌아갈 방법이 있다. 그런데, 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었을 때 달리던 습관으로 일을 저지르고 보니 너무 멀리 와 있었다.
“그냥 여기서 일주일 푹 쉬다가 곧바로 뉴욕으로 가자.” 혼자서 운전한 남편도 꽤 힘들었는지 그러자고 했다. 그런데 이틀 지내고 나니 마음이 다시 젊은 시절로 깜빡, 퀘벡으로 달리잔다.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까짓거 또 가보는 거지.” 다행히 숙소를 미리 정하지 않아 달리다 피곤하면 어디서라도 쉴 수 있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우며 “이젠 집으로 가자. 너무 피곤해.” “마누라! 예전에 해지는 온타리오 호수에서 수영하던 것 못잊어 가고 싶어 했잖아. 몬트리올에 들른 다음, 온타리오 호수에 몸은 담고 가야지!”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몬트리올에서 한참을 방황했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하루 자고 나니 남편은 다시 캐나다 오타와로 가잔다. 다음 날 더는 캐나다로는 가기 싫었다. 흘러흘러 남쪽으로 내려오다 뉴욕주 레이크 조지에서 묵었다. 사라토가 스프링에서 브런치를 먹고, 2시간만 가면 집에 도착할 수 있는 우드스탁에 멈췄다.
50년 전 록페스티벌이 열렸던 우드스탁. 번화가 아기자기한 상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작은 폭포 앞에 앉아 있었다. 휴가용으로 빌려주는 집 서너 채가 눈에 띄었다. 마침 집주인이 말을 걸며 집 구경하라기에 들어가 봤다. 이 나이에 힘들고 위험하게 차로 돌아다닐 것이 아니다. 차라리 우드스탁에 작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나 안전 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그러나, 집값이 만만치 않다.
여행 떠나기 전에는 ‘까짓거’ 하고 달린다. 달리다 보면 ‘아차’ 싶다. 이 나라는 땅 덩어리가 너무나 넓다. 대지가 거대한 파도처럼 기복을 이루며 끝 간데없이 작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 살면 살수록, 알면 알수록 만만치 않은 나라다. 미국은. Big Country.
 이수임/화가
이수임/화가-
노바스코샤에서 뉴욕으로 온 저로써는 운전의 추억이 생생하게 느껴지네요! 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