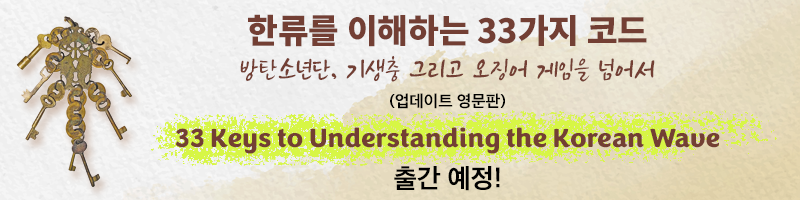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440) 이수임: 이웃집 여인들
창가의 선인장 (87) The Women Next Doors
이웃집 여인들

“수, 이상한 소리 듣지 못했어?”
화려하게 펴보지도 못하고 시든 꽃봉오리를 간신히 지탱하듯 초췌한 모습으로 옆집 여자가 문을 두드렸다. 나직한 소리로 묻는 그녀의 표정이 심각하다. 가벼운 걸음걸이로 그림자처럼 건물을 드나드는 그녀는 무척이나 말랐다. 단발머리에 자그마한 예민하고 창백한 얼굴은 근심으로 자잘한 주름이 져있다.
내가 처음 이사왔을 때 불편한 점을 물어보며 도와줄 자세로 가장 먼저 다가온 이웃이다. 사실 난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다. 그동안 더 불편한 곳을 전전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감사하며 즐겁게 산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모르면 구글에 검색하고 여러 번 실수를 반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이사한지 얼마 안 되어 그녀가 "건너편 집 개 짖는 소리를 들었냐"고 물었다. 듣기 싫긴 하지만 참을 만하다고 말했다. 또, 얼마 후 "윗집에서 아이가 쿵쿵거리며 뛰는 소리가 나지 않냐"고 물었다. 전쟁 전에 지은, 소위 'prewar building'이라고 해서 계층 간의 소음이 없지만, 작은 소리에도 몹시 민감한 듯 그녀는 지친 모습이다.
또 다시 그녀가 문을 두드린다. 초조한 얼굴로 "드르르 쓱쓱 싹싹 뭔가를 끌고 밀고 당기는 수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다. 그녀의 야윈 얼굴을 쳐다봤다. 내가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더 마르고 불안한 모습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용히 귀기울였지만, 내 귀엔 전혀 들리지 않는다.
앞집 여자는 오페라 가수다. 아침 나절 그녀는 목청 높여 연습한다. 정열적인 그녀와 어쩌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분위기는 고조된다. 높은 톤으로 내가 입은 외출복을 칭찬하는 그녀의 상냥한 목소리는 마치 오페라 무대에서 연기하듯 오르락내리락 음을 탄다.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끄는 편안하고 푸근한 그녀는 항상 신발을 문밖에 벗어 놓는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과 장화도 으레 문밖에 널브러져 있다. 나는 주위에 사물이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성격상 시선이 편치않고 신경이 거슬린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노랫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집 앞에 놓인 신발이 없어졌다. 항상 보이던 것이 없으니 의아했다. 얼마 후 그녀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신발은 다시 문밖 제자리로 돌아왔다. 지금은 그녀 집 문앞에 놓인 신발을 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청각이 너무 예민한 옆집 여자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혹시나 심한 노이로제로 몸져누운 것은 아닌가? 나는 신경 쓰며 옆집 소리에 귀 기울인다. 내 눈에 거슬리던 짓을 계속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던 짓을 멈추면 왜? 하며 의아함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나만의 습성일까?
 이수임/화가
이수임/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