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가 이영주의 트래블로그: 버진아일랜드 세인트존 (2) 프랜시스 베이에서의 하루
수필가 이영주의 트래블로그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존 일기 <2> 프랜시스 베이에서의 하루
바다와 푸른 하늘과 바람...또 한 페이지의 '추억전설'

프랜시스 베이에서 가족 사진
세인트 존은 버진 아일랜드 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비치들을 자랑하던 섬이기에 가기 전부터 기대가 컸다. 하지만 몇 년 전, 허리케인이 할퀴고 간 버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존은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웠다. 푸르름을 자랑하던 숲들이 많이 헐거워졌고, 비치들의 모습이 홀쭉해졌다. 하지만 자연은 자생 힐링 능력이 있다. 헐거워진 숲에선 다시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에메랄드 빛 바닷물은 여전했다.
프랜시스 베이는 그나마 모래사장이 제일 넉넉한 비치였다. 우리 가족은 딸들을 비롯해서 사위들, 손자 블루까지 바다 팬이라 바다에만 오면 얼굴에서 희열이 팡팡! 터진다. 집에 있을 때도 매일 일 끝나고 퇴근해서 2시간씩 수영을 하고나야 저녁을 먹는 큰 사위 안드레아는 혼자 헤엄쳐서 옆쪽의 이웃 비치까지 다녀왔다. 그런 이모부 안드레아와 제법 깊은 곳까지 헤엄쳐간 블루는 그곳 바다 속에서 무척 큰 거북이를 보고서는 흥분했다.

우리집의 스타, 첫째 내외
블루는 할머니도 봐야 한다며 내 손을 꽉 잡고 같이 거북이를 보러 가자고 나를 잡아끌었다. 내겐 하이웨이 포비아 외에도 깊은 물 포비아가 있다. 그러므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공포감을 느껴서 깊은 물엔 못 들어가고 바다 초입에서만 수영할 수 있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블루가 성화를 대고, 둘째 사위 크리스찬도 자기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심장이 멎을까 두려워 사양했다. 섭섭해하는 블루만큼이나 나도 많이 아쉬웠다.
헌데, 아름다운 프랜시스 베이에 단점이 있다. 바닥에 바위들이 여기저기 울퉁불퉁 솟아 있어서 멋모르고 걷다가 다치기 쉽고, 웅덩이도 산재해 있어서 얕은 줄 알고 들어갔다가 푹 빠지는 바람에 혼비백산하기도 했다. 그래도 주변의 산들로 하여 아름다운 풍광이 남아있는 것만도 축복이라 여겨진다.

프랜시스 베이 비치
다음 날 아침, 우리에게 숙소를 제공해준 글렌다와 둘이 프랜시스 베이로 아침 산책을 나왔다. 이른 아침이므로 비치엔 우리 두 사람 뿐이었다. 글렌다는 기뻐하며 “여기 아침 일찍 와서 걸으면 언제나 아름다운 이 해변에 나 혼자 뿐이에요. 그러면 이 해변이 마치 내 것 같아서 참으로 행복해요”, 한다.
나 역시 산에 다닐 때, 나 혼자 산을 오르고 있으면 “아, 이 산은 내 정원이다!”, 하며 도장 찍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꽤 많은 뉴욕 업스테이트 산의 어느 봉우리는 내 앞동산, 어느 큰 봉우리는 내 뒷동산, 어느 골짜기는 앞마당, 어느 폭포는 내 목욕탕 하며 도장 찍어 놓은 내 부동산이 엄청나다. 수입 하나 없는 노년이지만, 스스로 부자라고 자부하며 사는 내 부의 원천이 바로 산들이다. 그렇지만 글렌다는 진짜 부자다. 그런 부자도 나처럼 자연에 욕심낸다는 게 귀여웠다. 할 수 없이 프랜시스 베이는 나와 글렌다가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할머니와 블루/ 수영하는 블루, 종일 물 속에서 안나온다
프랜시스 베이에서 우리 가족들은 종일 바다를 드나들며, 독서도 하며, 낮잠도 자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오직 블루만이 쉬지 않고 물 속에서 놀았다. 나중엔 모두들 놀아주지 않으니까 젤 만만한 할머니를 끌어내어 잠시도 놔주지 않는다. 나중엔 조개껍질을 바다보물을 찾는 것이라며 비치 끝까지 조개껍질 채취에 나서야 했다. 모래 속에서 녹슨 자동차를 찾아낸 블루는 바다 속에 묻혔던 보물이라며 소중히 모셔놓더니 나중엔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보물을 캐야 한다며 도로 모래 속에 파묻어준다. 고동을 주어서는 바다 소리가 들린다고 귀에 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식구들 귀에다 대어주기도 하며 있는 대로 신이 났다.
우리 가족은 모이면 늘 이렇게 재밌고, 신난다. 첫째는 분위기 메이커. 분위기 돋구며 그 와중에도 계속 셔터를 누르며 찍사 노릇에도 열심이다. 둘째는 계속 엄마의 동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엄마 몸에 무리갈까 봐 관리해주고, 막내는 언니들이 물 속에 들어가면 엄마가 심심해 할까봐 친구해준다. 바다와 푸른 하늘과 바람!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웠던 우리 가족은 이렇게 또 한 페이지의 추억전설을 기록했다.

이영주/수필가 강원도 철원 생. 중앙대 신문학과 졸업 후 충청일보 정치부 기자와 도서출판 학창사 대표를 지냈다. 1981년 미국으로 이주 1990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한 후 수필집 '엄마의 요술주머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키울게' '내 인생의 삼중주'를 냈다. 줄리아드 음대 출신 클래식 앙상블 '안 트리오(Ahn Trio)'를 키워낸 장한 어머니이기도 하다. 현재 '에세이스트 미국동부지회' 회장이며 뉴욕 중앙일보에 '뉴욕의 맛과 멋' 칼럼을 연재 중이다. '허드슨 문화클럽' 대표로, 뉴저지에서 '수필교실'과 '북클럽'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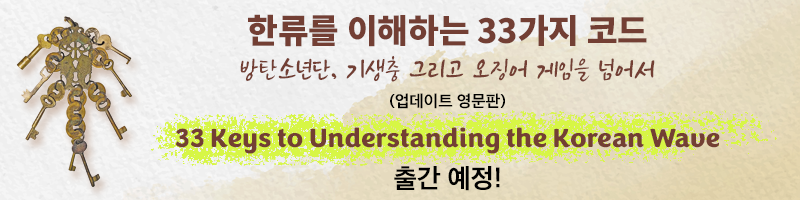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수필가 이영주의 트래블로그: 버진아일랜드 세인트존 (3) 안트리...
수필가 이영주의 트래블로그: 버진아일랜드 세인트존 (3) 안트리...
 수필가 이영주의 트래블로그: 버진아일랜드 세인트존 (1) 하비와 ...
수필가 이영주의 트래블로그: 버진아일랜드 세인트존 (1) 하비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