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552) 홍영혜: 겨울 숲엔 새 길이 보인다
빨간 등대 (36) A Naked Season
겨울 숲엔 새 길이 보인다

Sue Cho, “Midday after the Snow”, 2021, Digital Painting
코비드-19가 시작되고 한 달 남짓하여 “일상이 그립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젠 “옛 일상이 와도 새롭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이 가버렸다. 뉴욕 아파트가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감옥처럼 답답해서, 아예 짐을 풀지 않고 조그만 트렁크를 열고 생활을 한다.
주말에 통나무집이 빌 때마다 그린우드 레이크를 찾는다. 뉴욕시보다 기온이 5도 내지 10도 낮고, 인슐레이션이 잘 안되어, 통나무집은 겨울나기가 힘들다. 뜨거운 물주머니, 전기담요, 허브 팩 등을 이용해 점점 노하우가 생겨 화씨 19도까지는 견딜만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바람이 차고, 해가 짧아 황금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사실 밖에 있는 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고 대부분은 집에 꽁 박혀있다. 그래도 신선한 공기와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 불편 법석에도 불구하고 통나무집을 찾게 된다. 봄 여름 가을을 여기서 지냈으니 겨울의 호수와 숲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도 반쯤은 된다.

겨울 숲은 눈이 오면 사방이 그림엽서 같다. 눈이 조금씩 오다 밤에 또 살포시 와서 일 인치 정도 통나무집 전경을 예쁘게 커버했다. 햇빛이 나자 똑 똑 똑 나무 위에 있던 눈이 녹아 눈길 위에 물방울 구멍을 낸다. 고요한 숲이라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동물과 사람들 지나간 발자국이 보인다. 어린 소나무 가지에 부담스럽게 쌓인 눈을 보고 울라브 하우게(Olav H. Hauge)의 시가 생각나서 장갑으로 눈을 털어 본다.
호숫가의 물이 햇빛에 반짝반짝, 맑은 물속에 조약돌이 보인다. 겨울이 되니 정박하는 배도 없고 물놀이 인파가 없어서 이렇게 맑은 호숫물을 처음 보는 것 같다. 까만 돌에 하얀 점박이가 눈과 입처럼 보이는 조약돌을 물에서 건져 주머니에 넣었다. 눈 쌓인 숲의 정경은 잠시, 그간 포근한 날씨로 눈이 다 녹아버렸다. 눈이 없는 겨울 숲은 텅 비어 썰렁하다. 황량한 숲속에 “지금 여기”를 즐기는 것이 힘들다. 겨울이 빨리 지나 봄이 오길,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어지길,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난국이 해결되길, 지금을 “fast forward”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에게 남은 귀한 시간을 기다림으로 허비하지 않고, 오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황량한 텅 빈 숲속에는 공간과 길이 보인다. 여름에 숲이 울창하고 잎이 무성할 때는 산책로의 외길만 보이고 그 길을 따라서 내내 걸었었다. 그런데 잎은 다 떨어지고 빈 겨울 숲속에는 무수한 길들이 보인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도 있다. 산등성이의 능선을 따라 이리저리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올라가 본다. 뱀들도 지금쯤 겨울잠을 자리라 믿으면서. (전에 트레일을 벗어나서 뱀을 두 번 만났다) 호숫가에 길이 나무 덤불로 막혀 끊어진 길도, 가지 사이를 헤치고 가니 오래전 물가 길이 나온다.

새로운 숲길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텐트를 치고 캠핑온 무리들이 산책길 한중간에 진을 치고 있었다. 여기를 뚫고 갈까 아니면 산책을 포기할까? 요즘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전염도 빠르다던데…. 숲으로 오기까지의 “불편 법석”이 아까워 포기가 안 되었다. 사냥 시즌이어서 지레 겁을 먹고 얼씬하지 않았던 스털링 포리스트 트레일로 방향을 돌렸다.
제대로 된 등산길이었다. 오르막길을 지나자, 개울이 흐르는 다리도 나오고 솔잎으로 된 폭신한 솔방울 길을 걸으니 마음이 가벼워진다. 커다란 통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었다. 여길 넘어가도 되나? 자세히 살펴보니 빨간 트레일 마크가 쓰러진 나무에 붙어 있고 사람들이 넘어가서 나무껍질이 벗겨져 닳은 흔적이 보였다. 나무위를 말 타듯 가뿐히 넘어 그 길로 계속 가보니, 그린우드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viewpoint가 나왔다. 이렇게 좋은 등산로를 놔두고 열 달 동안 매일 똑같은 숲길만 반복했을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인생의 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동안 숨 가쁘게 여름 숲의 외길만 달려왔다. 일상이 무너지고, 일의 터전을 잃고, 많은 죽음을 목격하면서, 어쩔 수 없이, 때론 과감하게 제2의 삶, 새 길을 찾아 나선다. “우리 모두 화이팅!”을 외쳐본다.

길이 끝나면
박노해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한쪽 문이 닫히면 거기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나온다
내가 무너지면 거기
더 큰 내가 일어선다
최선의 끝이 참된 시작이다
정직한 절망이 희망의 시작이다

Sue Cho, “We walk and talk like friends”, 2021, Digital Painting
수 조(Sue Cho)/화가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서양화와 판화를 전공하고, 브루클린칼리지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뉴욕주 해리슨공립도서관, 코네티컷주 다리엔의 아트리아 갤러리 등지에서 개인전, 뉴욕한국문화원 그룹전(1986, 2009), 리버사이드갤러리(NJ), Kacal 그룹전에 참가했다. 2020년 6월엔 첼시 K&P Gallery에서 열린 온라인 그룹전 'Blooming'에 작품을 전시했다.
홍영혜/가족 상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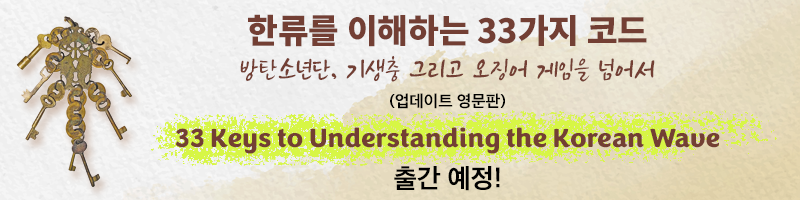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553) 이영주: 블루와 할머니의 어드벤처
(553) 이영주: 블루와 할머니의 어드벤처
 (551) 박숙희: 한류 33 코드 #28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551) 박숙희: 한류 33 코드 #28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