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 백! 그랜드센트럴터미널 오이스터 바에서의 점심식사
오이스터 바 코로나 팬데믹 휴지기 후 오프닝
메뉴 축소, 가격 인상, 서비스 강화, 고요한 분위기

Raw Oyster Plates at Oyster Bar, Grand Central Terminal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요식업계 최대의 재앙이었다. 뉴욕에서도 테이크아웃 전문 식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 연방정부의 임금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식당구제기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로 횡재한 식당도 있다. 하지만, 뉴욕시에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백신 접종 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외식문화의 즐거움도 앗아갔다. 그래도 서서히 뉴욕의 식당들은 외식에 굶주려왔던 이들을 환영하며, 재기하고 있는듯 하다.
아름다운 기차역, 그랜드센트럴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의 1913년 오픈한 유서 깊은 레스토랑 오이스터 바(Oyster Bar)는 팬데믹으로 더욱 더 피해를 입었다. 사실 오이스터 바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보다 하루 먼저 오픈했다. 1913년 2월 2일 기차역이 오픈했고, 그 전날인 2월 1일 오이스터 바는 건축가(휘트니 워렌과 찰스 델리반 웨트모어) 그리고 100여명의 게스트를 모아 오프닝 파티를 열었다.
팬데믹 이전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메트로노스 기차를 타고 통근하는 이가 하루 평균 75만명이었고, 관광객은 연 5천여만명에 달했던 기차역, 이곳에 자리한 오이스터 바는 기나긴 휴면에 들어갔다. 뉴욕에서 제일 싱싱한 해산물을 제공하는 오이스터 바의 맛과 멋진 인테리어가 주는 즐거움과 분주한 고객으로 가득한 이 레스토랑의 생동감이 사라졌다. 그리고, 9월 중순에야 조심스럽게 오픈했다.

Happy Hour Oysters(Blue Point, $1.25) at Oyster Bar, Grand Central Terminal in 2013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컬빗 독자분들과 함께 '10가지 수수께끼'를 주제로 수차례 투어를 한 적이 있다. 컬빗은 '오이스터 바를 사랑하는 이유를 7가지'(2013 포스트)에서 해피 아워, 생굴, 런치 샌드위치, 콤비네이션 팬로스트, 손글씨 메뉴, 구아스타비노 천장, 그리고 휘스퍼링 갤러리를 이유로 들었다.
'해피 아워'를 즐겼던 생굴의 팬으로서 오이스터 바의 '그랜드 리오프닝'을 목마르게 기대했다. 우리는 9월 초에 예약했지만, 연기되어 9월 말에서야 점심을 먹으러 갔다. 항상 북적거리던 그랜드센트럴터미널은 슬로모션이 돌아가듯 너무나 한산했다. 정문에서 색소폰을 부는 거리의 악사가 팬데믹의 우울함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듯 했다.
시계탑과 천장의 별자리, 도토리 모양의 샹들리에가 있는 아름다운 그랜드 콩코스도 고요했다. 지하의 푸드 코트도 싸늘했고, 마켓에는 철거한 그로서리가 보였다. 가끔 부츠를 닦던 '레더 스파'의 의자들은 텅 비었고, 구두 닦는 여인은 의자 사이에서 졸고 있었다. 오이스터 바 앞 '휘스퍼링 갤러리(Whispering Gallery)에서 늘 속삭이며 까르르르 웃던 여행자들도 없었다.


Oyster Bar(counter) at Grand Central Terminal
이런 분위기에서 오이스터 바가 오픈한 것이 감사할 정도였다. 오후 1시 경 늘 만석이던 메인 다이닝 룸과 바 카운터도 썰렁했다. 우리는 살룬에 테이블을 잡았다. 네다섯개의 테이블에 손님들이 식사 중이었다. 모두들 속삭이듯 평소보다 소음 레벨이 훨씬 낮았다. 오히려 노년의 웨이터가 우리를 "웰컴 백"하는 목소리가 우렁찼다. 단골이었던 친구를 기억하는 우리는 오이스터와 팬로스트에 굶주렸었고, 그 웨이터는 손님에 굶주렸던 것 같다. 우리 모두 팬데믹의 피해자들이다. 하지만, 생굴과 팬로스트 수프가 우리의 입맛과 기분을 살려주리.

Oyster Bar(Saloon) at Grand Central Terminal
오이스터바의 빨간 체크 헝겊 테이블보는 앏은 플라스틱으로 바뀌었다. 손글씨(같은) 1일 종이 메뉴는 크기가 확 줄었다. 백과사전처럼 빽빽했던 메뉴가 헐렁했다. '해피 아워'는 사라졌고, 생맥주(draft)는 기계 고장이었다. 웨이터는 메뉴가 축소된 것에 대해 무척 미안해 했다. 생굴의 가격도 올라갔고($2.95-$3.95), 우리가 즐겨 먹었던 콤비네이션 팬로스트($28.75)도 비싸게 느껴졌다.(2013년 $21.95)

하지만, 그동안 외식을 못함으로써 엥겔지수가 내려갔으니, 그날 만큼은 포식할 준비가 되었다. 생굴 6개를 골랐고, 며칠 전 랍스터를 먹었고, 집 냉장고에 왕새우 두마리가 있으니, 콤비네이션 대신 훨씬 싼 오이스터 팬로스트($16.45)를 주문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팟츠빌 양조장에 들렀던 옌링(Yuenling) 라거 한병을 시켰다.


Oyster Bar(Saloon) at Grand Central Terminal
평소에는 잘 건드리지도 않던 식전 빵과 깨 비스킷을 버터에 발라 먹기 시작했다. 생굴 6개가 칵테일 소스, 비네거릿 소스, 포크에 찔린 레몬 한조각과 함께 나왔다. 큼직한 벨론(Belon, 메인주)를 한 입 베어 물자 그 육질과 바다내음에 마치 근사한 스테이크를 씹는 것처럼 황홀감을 주었다. '오이스터 스테이크'라 부를 만했다. 테이스팅 메뉴의 정교한 요리보다 이 생굴을 선택하리. 칵테일 소스에 호스래디쉬를 추가해서 찍어 먹으면, 천상의 맛이다. 그리고, 웰플리트(Wellfreet, 매사추세추주), 자그마한 와치 힐(Watch Hill, 로드 아일랜드주), 페마퀴드(Pemaquid, 메인주), 파니 베이(Fanny Bay,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리고 말페크(Malpeque,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로 생굴 메들리를 즐겼다.
굴 콤비네이션 팬로스트로 굴 제 2부를 시작했다. 스튜는 크림, 버터, 조개국물로, 팬로스트는 여기에 칠리와 토스트를 추가한다. 팬 로스트가 50센트 정도 비싸고, 헤비하지만, 훨씬 더 입 안에 온 감각을 증폭시킨다. 웨이터는 수시로 우리 테이블에 와서 뭐 필요한 것이 없나 체크했다. 이런 서비스는 오이스터 바에서 처음이다. 팬데믹은 모두를 더 친절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Oyster Bar at Grand Central Terminal
웨이터가 시즌이 끝나간다며 추천해준 소프트셸 크랩 튀김 샌드위치($15.25)는 싱싱하고, 통통한 게살과 육즙이 감미로웠다. '여름의 별미' 소프트셸 크랩 은 차이나타운 뉴욕 누들타운(NY Noodle Twon)의 소프트셸 크랩을 방불케했다. 코울슬로는 평이했지만.
시원한 옌링 라거와 함께 온몸에 엔돌핀을 치솟게 하는 오이스터 바에서의 점심식사는 행복하게 끝났다. 오이스터 바가 다시 북적북적해질 날을 기다리며... Welcome Back Oyster Bar! See you soon:)
오이스터 바는 10월 4일부터 영업시간을 확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30분-오후 8시 30분(마지막 테이블), 토요일과 일요일엔 휴업한다.

Oyster Bar at Grand Central Terminal
89 E 42nd St, New York, NY 10017
Grand Central Terminal, Lower Leve
https://www.oysterbarny.com

All rights reserved. Any stories of this site may be used for your personal, non-commercial use. You agree not to modify, reproduce, retransmit, distribute, disseminate, sell, publish, broadcast or circulate any material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NYCultureBea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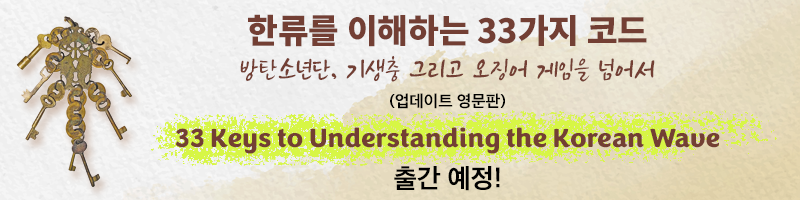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2021 세계 최고 식당 덴마크 노마(NOMA)에는 무엇이?
2021 세계 최고 식당 덴마크 노마(NOMA)에는 무엇이?
 컬빗키친 레시피 (11) Live! 포슈 랍스터+던저니스 크랩 삶아 먹기
컬빗키친 레시피 (11) Live! 포슈 랍스터+던저니스 크랩 삶아 먹기


싱싱한 해산물로 유명한 오이스터 바가 오랜 침묵 끝에 open을 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굴 애호가인 남편과 같이 가서 맛있게 먹을 생각을하니까 행복해집니다. 행복이 별건가요? 이런게 행복이지요. 그리고 컬빗에게 오이스터 바에서 한턱 쏘겠습니다.
-El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