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739)
- 강익중/詩 아닌 詩(86)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52)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5)
- 홍영혜/빨간 등대(71)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726) 켈리 맥마스터스: 내가 매년 부고를 직접 쓰는 이유, Why I Write My Own Obituary Every Year
Why I Write My Own Obituary Every Year
"내 부고는 위안이며, 수정할 기회를 준다"
NYT 칼럼

호프스트라 대학교 영문과의 켈리 맥마스터스(Kelly McMasters) 교수가 9월 29일 뉴욕타임스에 '내가 매년 부고(사망기사)를 쓰는 이유(Why I Write My Own Obituary Every Year)'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맥마스터스 교수는 한때 서점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출간된 '떠나는 계절: 회고록 (The Leaving Season: A Memoir-in-Essays)'의 저자다.
맥마스터스는 지난 주에도 부고를 썼다. 그는 1년에 한번씩 자신의 사망기사를 쓰는 것이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그의 지인들 중에도 자신의 부고를 종종 쓰는 이들이 있다. 어느 교사는 매년 자신의 부고를 쓰거나, 연말까지 희망하는 자신의 부고를 쓰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다. 어떤 친구는 유대인 새해인 로시 하샤나(Rosh Hashanah)에 자신의 부고를 쓴다. 또 한 친구는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오르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자신의 삶 이야기를 썼다. 그것은 산 사람의 부고(a living obituary)다.
켈리가 처음 부고를 쓴 때는 12살 무렵, 동네 호스피스(말기환자들을 돌보는 서비스)에서 자원봉사로 일하던 엄마가 말기 환자들을 돌보기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신의 부고를 써야 했다. 엄마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켈리도 일기를 토대로 써내려갔다. 나이와 집을 포함한 사실, 생존자,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성취,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것이다. 엄마는 그후로도 20년 동안 호스피스에서 일했다. 엄마가 만났던 모든 환자들은 몇시간 만에 혹은 몇달 후에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이 쓴 부고들을 돌이켜 보니 어떤 해는 짧고, 형식적인, 어떤 해는 기쁨과 희망, 심지어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어느 해에 소중했던 것이 다음 해엔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딸, 아내, 1자녀의 엄마, 2자녀의 엄마에서 이혼, 어려웠던 이사나 이동, 혼란, 타인의 죽음 등을 기록했다.
쓸거리가 없는 해엔 야심찬 부고도 써봤다. 94세까지 살았다고 상상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복권에 당첨되고, 동네 도서관에 거액을 기부하고...항공 조종사 면허증을 따고, 고고학적 발굴을 하고! 아일랜드 해안에 별장을 소유하고! 등을 써보기도 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 남았는지를 생각한다.
맥나스터스는 2001년 9.11 때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있었고, 부고를 쓰기 힘들었다. 최근엔 결혼과 이혼으로 힘든 몇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도 부고를 전혀 쓸 수 없었다. 두 아이를 둔 싱글맘으로 2020년 봄에 그녀를 사로 잡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부고가 연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24개월만에 부고 쓰기에 복귀했을 때 시간은 탄력적이고, 뒤틀린 것처럼 느껴졌다. 블랙홀 주변에서 글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에 부고를 쓰는 것은 일종의 위안을 준다. 부고는 사후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공개 문서이지만, 일기에 쓰면 더 친밀한 인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 사적인 기록은 보도가치가 없으며, 사실에 근거할 필요도 없다. 오래 전에 썼던 자신의 부고를 읽으면서는 과거의 내 모습을 넘기고 있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그건 예전의 나와 인사를 수 있는 것으로 위안을 얻는다.
올해는 부고를 평소보다 엄숙하게 쓰게 됐다. 막내 아들이 마지막 유치를 잃었기 때문인가 보다. 첫번째 줄에는 이름과 사망 연련을 쓰는데, 48세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진작가이자 기자였던 이모, 그에게 첫 일기장을 주었던 이모가 사망한 해다. 큰 아들은 이모가 떠날 당시의 내 나이인 14세다. 이모가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다.
뉴욕 타임스의 부고란에 대한 다큐멘터리 'Obit'에서 마갈릿 폭스 기자는 "부고는 죽음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삶과는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한다. 우리가 죽은 후에야 부고를 쓰고 스스로는 결코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몹시 불공평해 보인다.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의 부고를 쓰면 삶에 대한 명확성을 얻을 수 있고, 다행히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정할 시간이 있다.
NYTimes: Why I Write My Own Obituary Every Year
https://www.nytimes.com/2024/09/29/opinion/write-your-own-obituary.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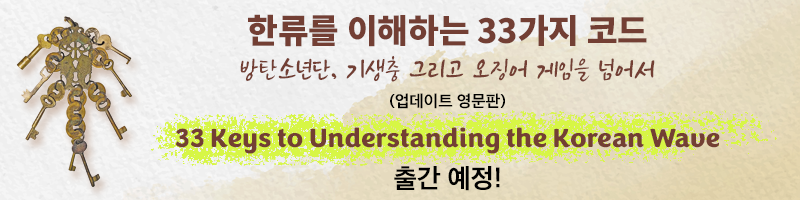






부고는 슬프다. 내가 나의 죽음을 알리다니 부끄럽다. 세상을 살면서 알릴 만한 좋은 일을 한 것도 없고, 그냥 이럭저럭 지낸게 다 아닌가 합니다.
켈리 맥마스터스가 매년 부고를 직접 쓴다는 걸 읽고 난생 처음으로 나도 써볼까 생각했습니다. 써지지 않아서 머리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컬빗은 때로는 깜짝 놀랄 아이디어로 신선함을 줍니다.
-El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