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729)
- 강익중/詩 아닌 詩(83)
- 김미경/서촌 오후 4시(13)
- 김원숙/이야기하는 붓(5)
- 김호봉/Memory(10)
- 김희자/바람의 메시지(30)
- 남광우/일할 수 있는 행복(3)
- 마종일/대나무 숲(6)
- 박준/사람과 사막(9)
- 스테파니 S. 리/흔들리며 피는 꽃(49)
- 연사숙/동촌의 꿈(6)
- 이수임/창가의 선인장(149)
- 이영주/뉴욕 촌뜨기의 일기(65)
- June Korea/잊혀져 갈 것들을 기억하는 방법(12)
- 한혜진/에피소드&오브제(23)
- 필 황/택시 블루스(12)
- 허병렬/은총의 교실(102)
- 홍영혜/빨간 등대(70)
- 박숙희/수다만리(66)
- 사랑방(16)
(47) 한혜진: 사랑합시다, 요리합시다
에피소드 & 오브제 (8) 사랑 호르몬과 요리 에너지
사랑합시다, 요리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만큼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는 테마도 없을 것 같다. 그 만큼 사랑은 우리의 행복 추구에 깊이 내재해 있는 명제인 모양이다. 노래방에 가보면 안다. 무려 노래목록 차트의 두장이 넘는 자리를 차지한 ‘사랑’자가 들어간 노래제목 앞에서 나는 때로 숙연해지기도 하는데,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랑의 ‘아메바성’ 때문일까? 우리는 사랑이 달콤하다 하기도 하고, 허무하다하기도 하고 때에따라 이러니, 저러니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울고 웃고 하는지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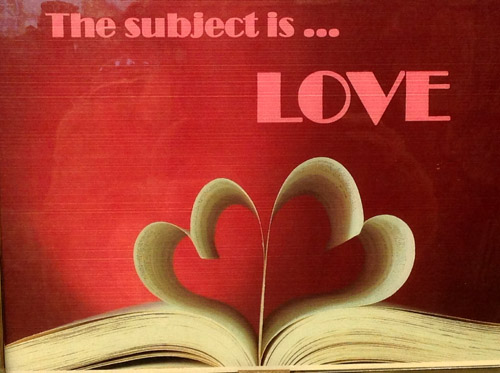
Photo: Hye Jin Han
사랑에 빗대어 볼 수 있는 것을 꼽으라 한다면, 나는 요리라고 대답하고 싶다. ‘사랑과 요리’ 이 둘은 많이 닮아 있다. 밥을 짓듯이 사랑도 짓는 것이니까 말이다. 특히 마구잡이로 할 수도 있고, 멋들어지게 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같다. 예를 들면 쌀을 씻어서 돌을 골라내고 알맞은 물을 부어 밥을 짓듯이, 사랑도 관심과 배려를 기울이고, 함께 시간나누기를 할 때 맛볼 수 있는 고소한 밥맛같은 것이리라.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 때, 요리법에 충실하면 근사한 음식을 얻을 수 있듯이, 사랑도 어쩌면 이와 비슷해서 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실망만을 얻게 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일찌기 티벳불교의 창시자인 달라이라마가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과 요리 만큼은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설파한 까닭이 여기에 있는 듯하다. 당신과 나를 ‘우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랑과 요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동격으로 올라 앉아 있다. 사랑만큼 요리도 귀중한 것이고, 먹는 일만큼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일게다.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사랑의 결핍도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하므로 그 영향력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사랑이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어주는 호르몬이라 한다면, 요리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삶의 원천인 셈이다.
사랑과 요리가 닮아 있는 또다른 면이 있다. 요리가 배고픔이라는 생태적인 고갈을 메꾸어주는 에너지원의 공급이듯이, 사랑은 외로움이라는 형이상학적인 허기를 채우려하는 우리들의 심리적 기제이며, 행동양식인 셈이다.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샆어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쪽보다는 받는 쪽에 줄서기를 서슴치 않는다. 유행가 가사처럼, 받을 땐 꿈 속같고 줄때는 안타까워서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랑의 참모습이란 자기를 내어줌이 아닐까? 사랑은 결국 ‘주는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요리는 주는 사랑과 너무나 닮아 있다. 사랑이 사소한 것을 챙기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인 것처럼, 요리도 사람의 정성어린 손끝에서 완성되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볶거나 지지거나 끓이거나 하여 가장 알맞게 간을 맞추고, 보기좋게 담아 사랑하는 이에게 뿌듯하게 내어놓는 마음의 행위인것이다.
그게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무어란 말인가. 상대방의 만족한 표정에서 나 또한 함박웃음이 나오는 이 살가운 교감, 이것이 곧 사랑이 아니겠는가? 번갯불처럼 짧지만, 짜릿한 감흥일 수도 있고, 어쩜 오래 기억되는 황홀한 순간일 수도 있겠다. 행복이란 이렇게 짧지만, 소박한 순간들로 점철된 미완성의 도형일 지도 모르겠다. 그 모습이란 우리가 천천히 열심히 그 하나하나의 점들을 연결해 나간 뒤, 마지막에야 확인할 수 있는.
 Photo: Hye Jin Han
Photo: Hye Jin Han
‘사랑합시다’라고 외치기 쑥스러우면, ‘요리합시다’라고 으근슬쩍 고쳐 부르면 어떨까? 작은 부엌이지만, 정성스럽게 식사가 준비되고, 잠시후 조촐하게 차려진 테이블 주위로 모여드는 가족, 그 단란함 속에서 피어나는 속닥거림. 나는 그 속에 사랑이 있음을 안다. 요리란 이렇게 추상적인 사랑을 따뜻한 한사발의 수프처럼 구체적으로 풀어낸다. 그냥 흘러가버리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따뜻하게 준비한, 밥과 국이 더 사랑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옛날 전기 밥솥이 없던 시절,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밥사발을 식을까봐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시곤 하던 생각이 난다. 사랑이란, 온기가 남아 있을때 품어서 간직해야 함을 어머니께선 이미 터득하고 계셨던 것 같다. 사랑은 가장 정성스럽게 음식을 내어놓는 일처럼, 서로가 할수 있는 최상의 사람 대접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다.
사랑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듯이, 요리란 그 사람의 특별한 취향이나 입맛에 딱 맞추어서 내어놓는 사랑의 매개체요, 받는 사람에게 있어선,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진면목인 셈이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찌개의 간을 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요리의 맨 마지막 단계 ‘간을 맞춘다는 것’, 이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의 ‘비위 맞추는 것’과 이리도 닮았을까? ‘간을 맞춘다는 것’. 간단하게 보여지지만, 쉽지않은 일이다. 나는 갑자기 사랑이라는 그 심오한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처럼, 자꾸 숟가락을 입에 갖다댄다.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한혜진/수필집 '길을 묻지 않는 낙타' 저자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후 결혼, 1985년 뉴욕으로 이주했다. 한양마트 이사로 일하면서 김정기 시인의 권유로 글쓰기와 연애를 시작, 이민 생활의 균형을 잡기위해 시와 수필을 써왔다. 2011년 뉴저지 리지필드 한양마트에 갤러리1&9을 오픈, 한인 작가들을 소개했으며, 롱아일랜드 집 안에 마련한 공방에서 쥬얼리 디자인도 하고 있다.






